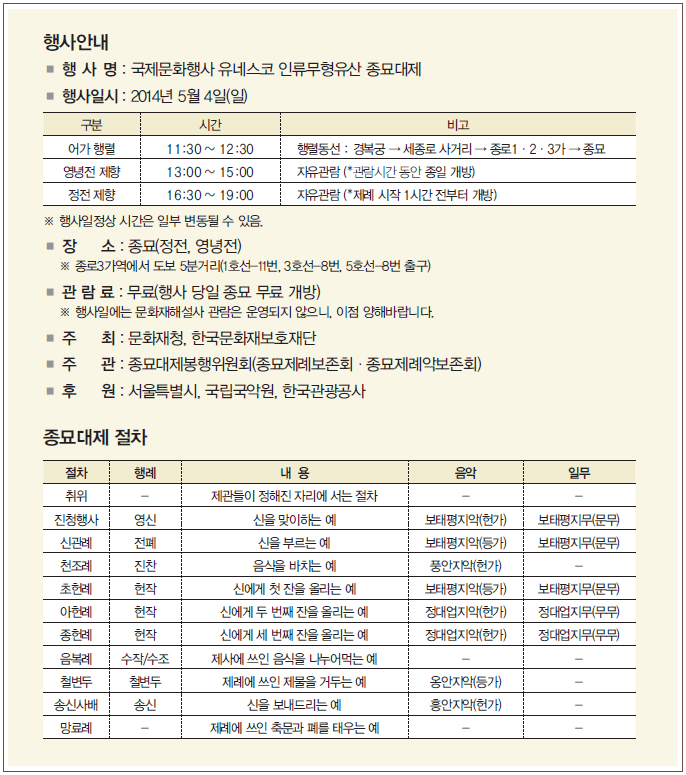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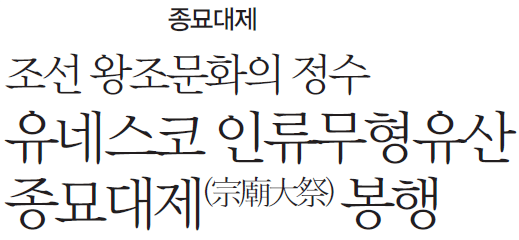
종묘제례는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지만, 1969년부터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의 노력으로 복원되었으며,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5월 18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걸작2)’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종묘대제가 국가의례로서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06년도부터는 국제문화행사로 격상되어 제례봉행과 행사운영을 분리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제례 의식에 맞추어 기악(樂), 노래(歌), 춤(舞)을 갖추어 연행하는 종합예술로, 악기연주에 맞추어 선왕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며 열과 항으로 벌려 서서 일무(佾舞)를 춘다. 그 연원은 조선 세종 대에 신악(新樂)으로 제정된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이며, 세조 10년(1464)에 이르러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1곡으로 개정되어 처음으로 종묘제례에 연주하면서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었다. 보태평은 조선의 역대 선왕들의 학문과 덕망을 기리는 내용으로 영신례, 신관례, 초헌례 때 연주되며, 정대업은 외적에 맞서서 군사상의 공적을 세운 선왕들을 기리는 내용으로 아헌례, 종헌례 때 연주된다. 이외에도 풍안지악(豊安之樂)과 흥안지악(興安之樂)이 연주된다. 이 곡들을 연주하는 위치와 악기 편성에 따라 악대는 등가(登歌)와 헌가(軒架)로 나뉜다. 상월대에 배치되어 하늘(天)과 양(陽)을 상징하는 악대를 등가라 하고, 하월대에 배치되어 땅(地)과 음(陰)을 상징하는 악대를 헌가라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사(人事)를 상징하는 일무 무인(舞人)이 자리하여 문덕(文德)과 무공(武功)을 내용으로 한 문무(文舞)와 무무(武舞)가 황제(皇帝)의 격을 갖춘 팔일무의 형태로 연행된다. 종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
정되었고, 2001년 종묘제례와 더불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러한 종묘제례가 거행되는 종묘(宗廟)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사당으로 태묘(太廟)라고도 한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는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 종묘를 건립하고 오른쪽에 사직단을 세웠다. 현재 종묘라고 하면 정전과 함께 영녕전을 포함해서 통칭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종묘란 원래 정전만을 지칭해 영녕전과는 구별해서 일컬었다. 종묘는 태조 3년(1394)에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되었고, 별묘인 영녕전은 세종 3년(1421)에 창건되었다. 종묘와 영녕전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광해군 즉위년(1608)에 재건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증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사적 제125호인 종묘는 뛰어난 건축적 가치와 6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제례 행사 등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첫 번째 일요일 종묘에서 봉행되는 종묘대제(宗廟大祭)에 정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