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언제부터인가 박물관 기증자료 가운데 악보나 악기와 같은 음악유물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우리의 척박한 전통문화유산 보존생태계에서 음악유물의 전승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 대개는 아쉬움으로 접는 것이 다반사다. 지난 2004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이신의(李愼儀) 종가(宗家) 소장(所藏) 유물(遺物) 수증(受贈)’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두드리면 열리고 궁하면 얻는다고 간혹 뜻하지 않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전의(全義) 이씨(李氏) 종가 집안에서 석탄(石灘) 이신의(李愼儀, 1551~1627)의 거문고를 40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기에 할 수 있으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다. 감칠맛 나는 연기로 인기를 얻고 있는 탤런트이자 영화배우 이한위 씨 집안에서 기증한 것이라는 후문을 듣고, 이후로 이한위 씨가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몇 백 년 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가 즐비하고 이들 고악기들은 고미술품처럼 특급대우를 받으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하는 풍토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고악기들에 대한 무관심과 비체계적 연구 보존 등 지지부진한 현실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새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정지표에 문화융성을 표방하였고 국가예산 중 문화재정 2%를 약속했지만 그 예산 가운데 우리 것을 보존하고 간직하는 데 뒤늦게나마 실질적인 예산이 쓰이길 소망해본다. 국립광주박물관 기증 보도자료 시점과 맞물려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1990년대에 발굴된 B.C. 1세기경 현악기(일명 신창동 현악기)와 400년 된 거문고를 함께 보는 겹호사를 누리게 되었다. 400년의 시간을 두고 대면했던 터라 거문고의 괘와 안족은 떨어져나가고 줄은 힘없이 판 위에 걸쳐져 있었다. 이러한 옛 거문고를 볼 때마다 우리 문화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온다. 하지만 거문고 뒤판에 새겨진 명문을 되새기다보면 이 악기의 내력에 배어 있는 무언의 힘이 그대로 전해져, 괘를 붙이고 줄을 이으면 금방이라도 이 악기의 주인이 ‘슬기둥 뜰’ 하며 한 가락 탈 것만 같다. 첼로와 같은 서양클래식 악기 뒤판에는 보통 어떠한 글이 새겨져 있지 않지만 거문고에는 악기의 제작 내력이나 가슴에 남을 좋은 명언을 새겨두는 것이 조선조 선비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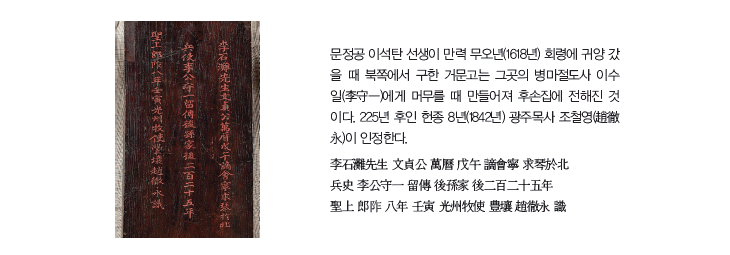
이신의 선생이 생전에 즐겨 연주하였던 거문고의 뒤판 명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18년 제작년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물 제957호로 지정되어 있는 탁영 김일손(金馹孫 : 464~1498)의 거문고와 견줄 만한 아주 오래된 거문고다. 이신의 기증자료 가운데 거문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거문고를 보관한 나무상자다. 조선시대 악기보관함으로는 유일무이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일본 나라시 동대사(東大寺) 옆에 있는 일본 황실보물창고인 정창원(正創院)에 신라에서 보내준 가야금이 시라기고또(新羅琴)라는 이름으로 3점과 시라기고또를 보관한 나무악기보관함 1점이 함께 보관되어 있다. 이로써 통일신라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조까지 거문고나 가야금 등을 악기보관함에 정갈하게 보존 관리하는 전통이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신의 집안에서 거문고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였는지 이를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신의는 1582년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예빈사 봉사(禮賓寺 奉事)로 관직에 들어섰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향군(鄕軍) 300명을 거느리고 적과 싸웠으며,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강화도로 가던 도중 병사한 실천적 관료이자 의사(義士)이기도 하였다. 유학자다운 굳은 성품으로 1617년 광해군의 폭정에 상소하다가 이듬해 한반도 북쪽 끝 회령(會寧)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유배 생활동안 정사에 대한 회한은 물론 무료함과 갑갑함을 씻어내고 양성(養性)을 다하기 위해 거문고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절친한 친구였던 병마절도사 이수일(李守一)에게 보낸 서한에 구구절절하게 나타나 있다.

“죄생(罪生)은 아랫것들의 부추김으로 겨우 목숨을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만리 밖의 깊은 곳에 갇히어 벽으로 둘러친 곳이라서 해를 볼 수 없으며 낮이 밤같이 어두우니 인생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서 심신이 쓸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꼭 필요한 일이라서 함부로 욕보이는 일이 되었습니다마는 바라건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죄생(罪生)은 소시(少時)에 (거문고곡) 감군은(感君恩) 1장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양구(陽九)를 만나 어두운 방에 거북처럼 움츠리고 있으니 낮에는 길고 긴 해가 지루하고 밤에는 외로운 등불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현금(玄琴) 하나를 얻어서 양성(陽性)을 빙자할 겸 파적(破寂) 거리로 삼을까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회령의 경내(境內)에서 지음자(知音者)나 일생에 금을 보지 못한 자가 있을 리 없으니 연목구어(緣木求魚)는 아닐 것이니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오? 측문(側聞)에는 영하(營下)에 금을 가진 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거문고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문고의 품질이 좋건 나쁘건 만드는 솜씨가 잘되건 졸렬하건 구애치 마시고 주선하여 주신다면 비록 천하의 가장 값비싼 명주(明珠)를 얻었다 한들 어찌 이것에 비기겠습니까? 바라건대 이 말이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서서히 은밀하게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중(因中)에서 거문고를 타는 일은 옛날에도 있었으니 별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여러 가지 형편이 수상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떠난 죄인이 반성은커녕 한가롭게 거문고를 타고 있다는 것이 조정에 알려지면 또 다른 위험이 닥쳐올 텐데 이를 개의치 않고 음율을 거문고에 실어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가다듬은 것이었다. 유배에 처해 있던 이신의의 거문고 사랑 못지않은 대단한 인물이 당시 회령의 병마절도사로 있던 이수일(李守一, 1554~1632)이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죄를 받은 이에게 관인으로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거문고를 구해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비통에 빠져 있는 이 고독한 친구를 위하여 본인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의를 다해 구해준 것을 보면 중국 춘추시대 백아(伯牙)와 종자기(鐘子其)의 지음(知音) 이야기에 비견할 만하지 않은가. 친구 이수일이 어렵게 거문고를 구해다주자 이신의는 고맙다는 편지를 바로 띄웠다. 67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 기뻐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뜻밖에 하서(下書)를 받고 영체(令體) 만중(萬重)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겸하여 보내주신 여러 가지 물건을 받고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이 현금(玄琴)을 보내주시어 고맙기 이를 데 없는데 하물며 잘 장식을 새긴 것이니 말입니다. 위중(圍中)에서 거문고를 얻음은 족히 열 명의 친구를 얻은 것에 당하여 졸음이 멀리 달아나고 긴 여름날이 다시 짧아졌으니 천하에 어떤 물건을 얻으면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거듭 배사(拜謝)하는 바입니다. 보내신 글 가운데 낡은 현금(玄琴)을 보수(補修)해서 보냈다고 하신 부분을 읽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가리어 먹고 목마른 자가 무엇을 골라 마시겠습니까 하물며 정장호제(精裝好製)이겠습니까? 拱壁(한 아름의 보옥)을 얻은 것으로 여기고 백번 엎드려 감사합니다.”
석탄 이신의는 이 거문고를 가지고 소나무(松)·대나무(竹)·매화(梅)·국화(菊)를 주제로 한 사우가(四友歌)를 지었다.
이 사우가(四友歌)에 실렸던 음악적인 음율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또박또박 박혀 있는 정신적인 음율은 유추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정신적 음율이 시간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 자연을 경외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한다.
사우가 (四友歌)
소나무(松)
바회예 셧 솔이 凜然줄 반가온뎌
風霜을 격거도 여외 줄 젼혜업다
얻디타 봄비츨 가져 고틸줄 모니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위엄이 있고 당당한 것이 반갑구나
풍상을 겪어도 여위질 않는 구나
어찌하여 봄 빛을 지니고 있어 고칠 줄 모르는가
국화(菊)
東籬의 심은 菊花 貴 줄를 뉘아니
春光을 번폐고 嚴霜의 혼자 퓌니
어즈버 고 내 버디 다만 넨가노라
동쪽에 있는 울타리에 심은 국화가 귀한 줄 누가 아느냐
따뜻한 봄 햇살을 마다하고 늦가을 서리에 혼자 피니
어즈버 맑고 고결한 내 벗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매화(梅)
곧이 無限호되 梅花를 심근 뜻은
눈속에 곧이 퓌여 비틴줄 貴도다물며 그윽 香氣 아니 貴코 어이리
꽃이 많되 그중에서도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눈과 같이 흰 빛인 것이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 또한 참으로 귀하구나
대나무(竹)
白雪이 즌 날애 대 보려 窓을 여니
온갓 곳간듸 업고 대히 푸러 셰라
엇디 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니
흰 눈이 자주 내리는 날에 대나무를 보려 창을 여니
온갖 곳은 간 데 없고 대숲만 푸르구나
어찌하여 대나무만 맑은 바람을 반기며 잎이 흔들흔들하는가
글˚주재근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