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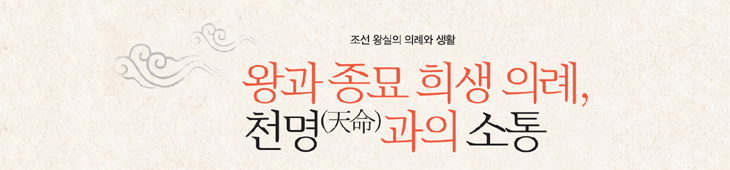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한 『용비어천가』는 ‘해동육룡이 나 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符) 하시니’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해동육룡이란 세종대왕의 여섯 조상인 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 태종을 의미한다. 이들 6명이 하는 일마다 천복을 받아 마침내 조선왕조를 창업한 것이, 고성(古聖) 문왕과 무왕이 하는 일마다 천복을 받아 주나라를 건국한 과정과 똑같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창업이 주나라의 창업과 그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하게 천명에 의한 것임을 노래한 것이 『용비어천가』다.
중국의 주나라는 서기전 11세기경의 인물인 문왕 때부터 번성하기 시작했다. 문왕의 아들 무왕 때에는 멀리 동쪽에 있는 은나라까지 원정하여 정복했다. 무왕이 은나라를 정복했을 때에,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鎬京)이라는 곳으로 현재의 서안 지역이었다.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킨 뒤 은나라의 후손 미자(微子)를 송나라에 책봉하고 제사를 잇도록 했다. 또, 은나라의 종묘를 천자의 종묘에서 제후국의 종묘로 강등시키기는 했지만 존속시켰다. 아울러 무왕은 은나라를 통제하기 위하여, 호경과 은나라의 중간쯤에 새로운 도읍을 설치하고자 했다. 그에 대한 예비 작업으로 오늘날의 낙양 지역에 낙읍(洛邑)을 건설하고 그곳에다 은나라의 종묘에서 빼앗아 온 구정(九鼎)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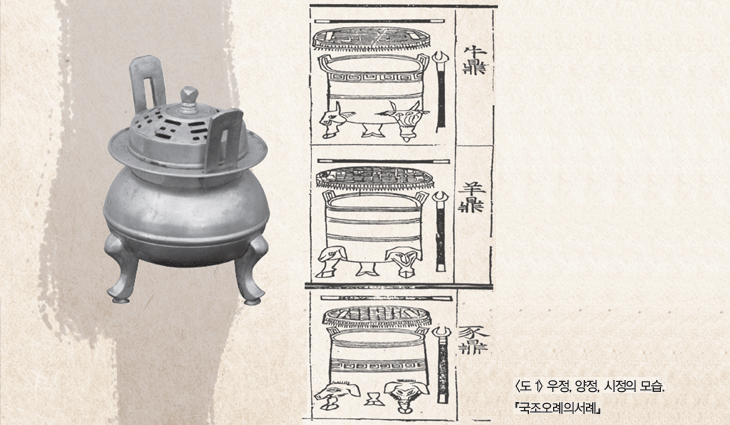
구정은 중국 하나라의 시조인 우 임금이 구주(九州)에서 금속을 거두어 주조한 큰 청동 솥 9개였다. 우 임금은 이 구정에 희생 제물을 삶아 하늘에 제사 지냈다. 즉 우 임금은 구정의 희생 제물을 통해 하늘과 소통하며 천명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구정은 하나라 때부터 천명을 받은 제왕의 정통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구정은 2개의 손잡이와 3개의 발이 달린 솥의 일종이었다. 이 구정은 하나라가 망한 뒤 은나라로 전해졌고, 은나라가 망하면서 주나라로 전해졌다. 그 구정이 종묘에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 하·은·주 시대에 천자의 권력과 정통성이 종묘와 구정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국 하·은·주 시대에 구정은 훗날의 옥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은·주 시대에 천자가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재상을 임명할 때에는 종묘에서 했다. 이를 통해 천자의 결정은 조상의 신령과 구정의 뜻, 즉 천명의 뜻으로 정당화되었다. 조선시대의 종묘 역시 천명이 머무는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었다. 종묘에는 천명을 받아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와 그 이성계의 천명을 계승한 역대 왕의 신령들이 모셔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묘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鼎)이 있었는데, 이들 정은 구정과 마찬가지로 희생 제물을 올릴 때 이용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에 의하면 정에는 우정(牛鼎), 양정(羊鼎), 시정(豕鼎)이 있었다. 이들 정은 3개의 발로 구분되었는데, 우정의 3개 발은 소의 발이었으며 여기에 소의 머리가 장식되었다. 또, 양정의 3개 발은 양의 발이었으며 여기에 양의 머리가 장식되었고, 시정의 3개 발은 돼지의 발이었으며 여기에 돼지의 머리가 장식되었다. 3개의 발에 장식된 동물 머리와 각각의 이름 그대로 우정, 양정, 시정은 소, 양, 돼지를 희생 제물로 쓸 때에 이용되었다. 왕이 종묘 제사를 지낼 때에는 희생 제물로 소 1마리, 양 5마리, 돼지 5마리를 썼다. 왕은 종묘 제사를 올리기 전에 7일간 재계를 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문병이나 문상을 하지 않았으며 주색을 끊고 오직 종묘 제사에 관한 일만 생각해야 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역대 왕의 신령들을 영접하기 위해서였다. 제사 하루 전 새벽에 왕은 궁중의 편전에서 제관들에게 향축(香祝)을 전했다. 제관들은 향축을 종묘의 향대청(香大廳)으로 옮겨 모신 뒤, 종묘 정전 안으로 들어가 제기(祭器)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했다. 그 전에 종묘 정전의 동쪽 문밖에 생방(牲榜)을 설치했는데, 생방은 희생 제물의 이름을 쓴 말뚝이었다. 제관들이 제기를 검사하는 동안, 장생령(掌牲令)은 희생 제물을 이끌고 와서 생방에 묶었다. 제기 검사를 마치고 제관들이 나와 정렬하면 장생령은 “희생 제물을 살펴보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먼저 종헌관(終獻官)이 나서서 희생 제물을 살펴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장생령이 손을 들고 “돈(月盾)”이라고 외쳤다. 돈이란 살쪘다는 뜻이다. 종헌관에 이어 여러 대축(大祝)들이 각각 희생 제물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 대축들이 함께 손을 들고 “충(充)”이라고 외친다. 충이란 충실하다는 뜻이다. “돈”과 “충”의 판정을 받은 희생 제물은 재인(宰人)에게 넘겨져 희생되는데, 이때 재인은 난도(鑾刀)라고 하는 특별한 칼을 사용했다.
난도는 칼날의 끝과 등 쪽에 작은 방울이 달려 소리가 나는 칼로서 태고의 칼을 상징했다. 이렇게 희생된 제물은 주방으로 옮겨져 확(鑊)이라고 하는 가마솥에서 삶겼다. 제사 당일 새벽에 왕은 최고의 예복인 면류관과 구장복 차림으로 편전을 나와 종묘로 행차했다. 구체적으로는 편전의 동온돌에서 대문 앞까지는 걸어갔고, 그곳에서 여(輿)라고 하는 가마를 타고 궁궐 정문까지 갔는데, 궁궐 정문에서 다시 연(輦)이라고 하는 가마를 타고 종묘 대문까지 갔다. 종묘 대문에서 다시 여로 갈아타고 재궁 문밖까지 간 뒤 그곳에서 내려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왕이 재궁에서 기다리는 동안, 각종 제물이 제기에 채워졌다. 이렇게 제사 준비가 완료되면 왕은 종묘 정전으로 가서 진향(進香), 진찬(進瓚), 전폐(奠幣)를 순서대로 거행했다. 진향은 하늘에 있는 혼령을 불러오기 위해 향을 피우는 의례였고, 진찬은 땅속에 있는 혼백을 불러오기 위해 옥잔에 들어있는 술을 땅에 붓는 의례였다. 전폐는 비단을 묶은 폐백을 신령에게 예물로 올리는 의례였다. 진향에서 진찬, 전폐는 새벽에 거행했기에 신관례(晨祼禮)라고 했다.
왕이 신관례를 거행하는 동안 몇 명의 제관이 주방으로 가서 확에 들어 있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우정, 양정, 시정에 옮겨 담았다. 이 정들은 종묘 정전 동문 밖에 설치된 찬만(饌幔)으로 옮겨졌다. 왕의 신관례가 끝나면 각각의 정에 들어 있던 희생 제물은 조(俎)라고 하는 제기에 각각 담겨 신령에게 올려졌는데, 이 의례가 진찬(進饌)이었다. 진찬 이후 왕은 초헌관이 되어 신령에게 술 석 잔을 올렸다. 이어서 고위 관료 중 아헌관과 종헌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또 신령에게 술 석 잔을 올렸는데, 보통 아헌관은 영의정, 종헌관은 좌의정이 맡았다.
삼헌례가 끝나면 왕은 음복례를 거행했다. 음복은 신령이 내려주신 복을 마신다는 의미로 제사에 사용한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는 의례였다. 물론 이때의 안주는 희생 제물로 이용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였다. 음복 이후 왕이 환궁하면서 종묘 제사는 완료되었다. 종묘 제사에 차려진 수많은 제물 중에서 희생 제물이 음복의 안주로 사용된 이유는 신령이 특별히 희생 제물을 통해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유는 자명하다. 왕은 희생 제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는 제기 그리고 올리는 의례 절차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했고, 신령은 그 같은 왕의 정성에 감동해 복을 준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왕은 희생 제물을 대표 매개로 하여 종묘의 혼령을 비롯한 천명과 소통하며 왕권을 지켜내고 나아가 나라의 안녕을 지켜내고자 했다.
글˚신명호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