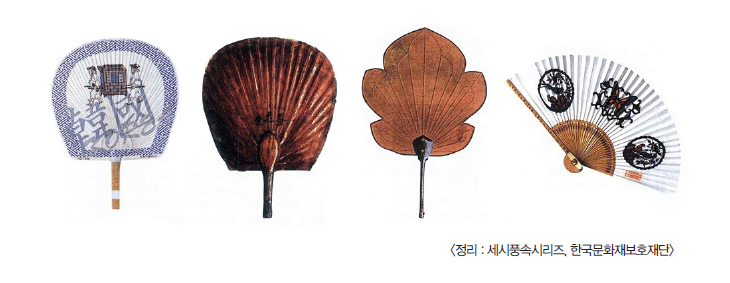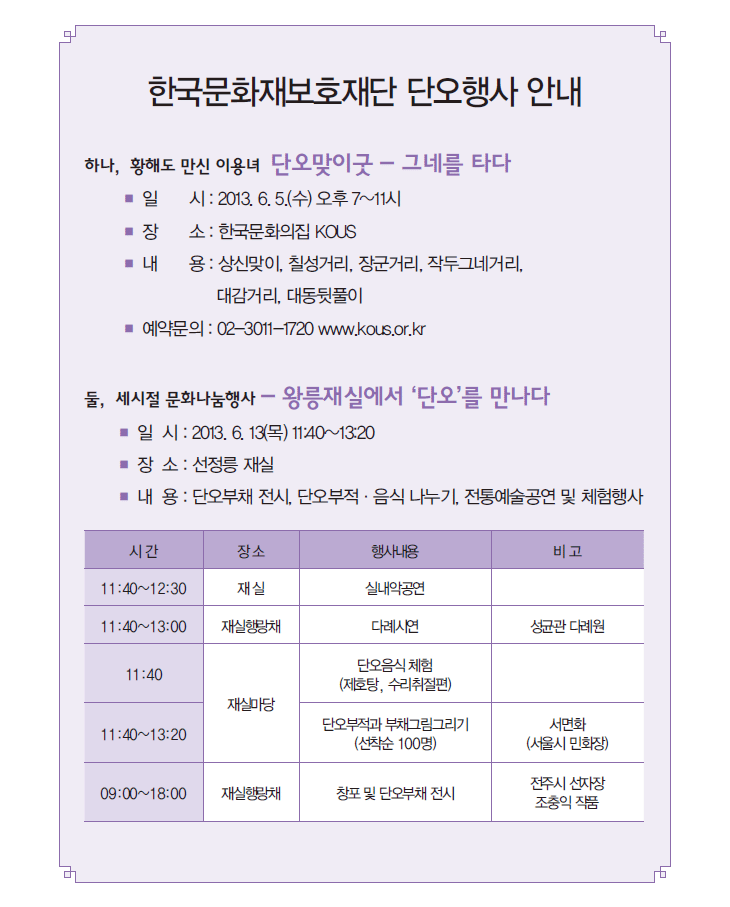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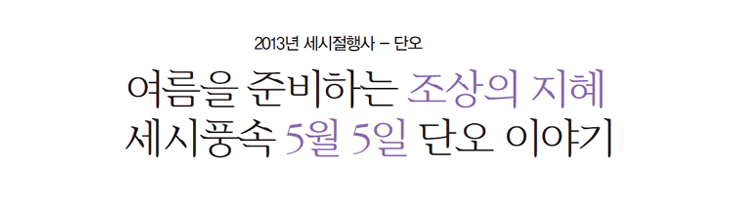
5월 5일은 무슨날? 하면 누구나 어린이날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세시풍속 중 하나인 단오도 그렇다.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지만, 음력 5월 5일은 단오인 것이다.
단오의 유래와 자랑스러운 세계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단오는 일명 수릿날[戌衣日·水瀨日],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단(端)’자는 첫 번째를 뜻하고, ‘오(午)’는 다섯의 뜻으로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뜻하며 이는 여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중오는 오(五)의 수가 겹치는 5월 5일을 뜻하는 것으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예로부터 큰 명절로 여겨왔다. 한편,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5월 조의 기록에 전한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날 쑥떡을 해 먹는데, 쑥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리’란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또 수리란 고(高)·상(上)·신(神) 등을 의미하는 우리의 고어(古語)인데, ‘신의 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불리워 졌다고도 하며, 수릿날은 태양의 기(氣)가 극(極)에 달하는 날, 다시 말해 인간이 태양신에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날이라 여겼다.
오늘날 단오는 설날과 추석보다는 명절로서의 의미가 작지만 고려시대에는 9대 명절에 속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에 속할 만큼 큰 명절로 여겨졌으며, 예로부터 많은 의례가 행해졌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의 큰 단오제가 행해졌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축제로 마을을 지켜주는 대관령 산신을 제사하고,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번영, 집안의 태평을 기원한다. 음력 4월 5일 신주빚기로 시작하여 4월 15일에는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사에서 성황신을 모셔 강릉시내 국사여성황사에 봉안한 뒤 5월 3일부터 7일 저녁 송신제까지 강릉시내 남대천 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오제 행사를 벌이는, 장장 30여일 이상에 걸친 축제인 것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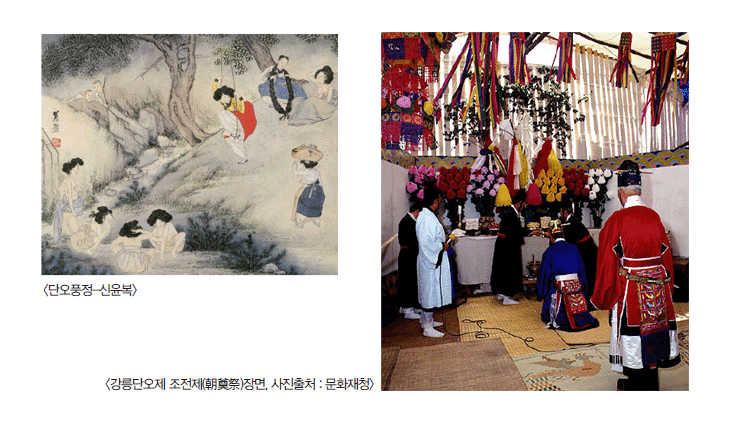
여름 더위를 이기는 단오 세시풍속
단오장
단오에는 창포를 넣어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액을 물리치기 위해 궁궁이를 머리에 꽂는다. 궁궁이는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 꽂으면 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다. 또 창포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거기에 벽사(辟邪)의 색인 연지나 주사를 바르거나 수복(壽福) 글자를 새겨 머리에 꽂거나 패용(佩用)하였다. 특히 비녀에 칠한 연지나 주사의 붉은색은 양색으로서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름 동안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단옷날 창포비녀를 꽂는 풍습이 생겼다. 이렇게 창포탕에 머리와 얼굴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창포 비녀로 치장하는 것을 단오장이라 한다.
제호탕과 앵두화재
조선시대에는 단오날 내의원에서 제호탕을 만들어 임금께 진상했고, 임금은 이것을 대신들이나 기로소(耆老所)에 하사했다. 제호탕은 오매육(烏梅肉), 사인(砂仁), 백단향(白檀香), 초과(草果)등을 곱게 가루내어 꿀에 재워 끓였다가 냉수에 타서 마시는 청량음료를 말하는데,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며 보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민가에서는 단오의 절식으로 제철인 앵두를 따서 깨끗이 씻고 씨를 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 두었다가 먹을 때 오미자 국물에 넣고 실백을 띄워 내는 앵두화채를 즐겨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더위를 이기는 청량음료인 셈이다.
단오부채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직접 단오날 각 지방의 공영에서 모아온 부채를 각 재상이나 시종들에게 하사했는데 이를 단오선(端午扇)이라고 했다. 부채의 쓰임새는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쫓는 외에도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또 얼굴을 가리기도 하며, 모기, 파리를 쫓는 데에도 쓰인다. 단오선의 종류에는 접선, 합죽선, 단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