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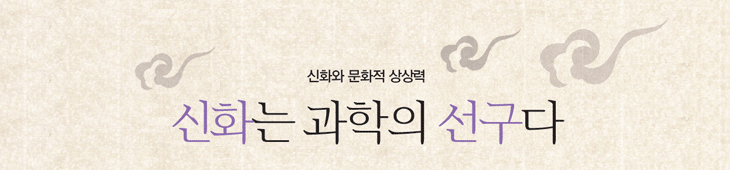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사실에 직면하는 경우, 우리는 흔히 “신화일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또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것을 두고 “신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에는 신화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단지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식이 잠재해 있다. 당연히 신화는 원시인류가 객관세계에 대해 상상과 환상이라고 하는 주관적 방법으로 인식하고 설명한 결과이기 때문에 신화의 서사 형식은 대단히 황당무계하고 비과학적인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물과 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서 지적하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신화와 과학은 동일한 과학적 인식 목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물과 현상에 대해 합리적 해석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적 수요다. 이러한 지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학문이 바로 과학이다. 과학은 한마디로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과 객관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 역시 세계와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과학과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특히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화와 과학은 어쩌면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신화와 과학이 차이가 있다면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신화는 상징과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과학은 가설과 추리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신화와 과학은 동일한 사실을 서로 다른 두 사투리로 말하는 것과 같다. 다음의 그리스신화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상징과 은유의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신화의 아켈로오스(Achelous)는 아이톨리아에 있는 최대의 강이자, 그 강의 신이다. 그는 변신하는 능력이 있어서, 황소나 뱀 등 자기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왕의 딸이자 미인으로 이름난 데이아네이라를 두고서 헤라클레스와 결투를 하였다. 처음에는 아켈로오스의 몸집이 워낙 컸기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서로 버티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려 했으며, 쉬었다가 싸우고 싸우다가 쉬는 것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네 번째 만에 헤라클레스가 아켈로오스를 땅 위에 넘어뜨리고 그의 등 위에 올라탔다. 마치 산이 내리 덮친 것 같은 헤라클레스의 완력을 견디지 못하고 아켈로오스는 하는 수 없이 뱀으로 변하여 빠져나갔다. 뱀의 형태로도 헤라클레스를 감당하지 못한 아켈로오스는 마지막 수단으로 황소로 변신하였다.
헤라클레스는 황소로 변신한 아켈로오스의 목을 팔로 감고 머리를 땅바닥에 질질 끌다가 모래톱 위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무자비한 손으로 그의 뿔을 하나 뽑았다. 님프(Nymph) 나이아스들이 그것을 손에 쥐고 성화(聖化)시켜 그 속을 향기로운 꽃으로 채웠다. 풍요의 여신이 아켈로오스의 뿔을 받아 자기의 것으로 공표하고, ‘풍요의 뿔’이라는 의미로 코르누코피아(Cornucopia)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지방의 님프 네 명이 강기슭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아켈로오스에게 비는 것을 잊어버리자, 화가 난 아켈로오스는 물을 차오르게 하여 그녀들을 바다로 휩쓸어 가버렸고, 그녀들은 바다의 섬이 되었다 한다. 이 신화는 표면상으로는 단순히 한 여인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 두 영웅 사이에 벌어진 결투의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신화는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투쟁과 함께, 하천의 변화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켈로오스는 우기(雨期)에 제방을 넘어 범람한 하천을 의인화한 것이다. 아켈로오스가 데이아네이라를 사랑하고 구혼했다는 이야기는, 그 하천이 데이아네이라의 왕국을 이리저리 굴곡을 이루며 관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뱀의 형태가 된다는 것은 구불구불한 모양을 이루며 흐르기 때문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행천의 의인화다. 물은 중력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지형의 고저에 따라 상류와 중류, 하류로 구분되고, 상류에서 빠르게 흐르던 강물은 중류와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차 유속이 느려지고 강폭도 넓어진다.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동안 암석 등에 부딪쳐서 강은 반드시 구부러진다. 즉 침식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강물의 바깥쪽에서는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바닥이 깎여나가고, 강물의 안쪽에서는 물살이 느리기 때문에 강물에 휩쓸려 내려온 물질이 쌓인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강은 갈수록 더욱더 심하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강을 사행천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행천이 범람하게 되면 다른 수로를 만들어 내는데, 황소로 변신한 아켈로오스가 머리에 두개의 뿔이 달렸고 헤라클레스의 힘에 눌려 꼼짝 못하자 뱀으로 변해 간신히 빠져 나갔다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고대인들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구부러지는 강줄기를 보고 강의 신 아켈로오스가 뱀으로 변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아켈로오스와 결투를 하였고 마침내 네 번 만에 아켈로오스를 물리쳤다는 것은 사람들이 제방을 쌓고 운하를 파서 하천의 주기적인 범람을 막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하신(河神)을 정복하고 그의 뿔을 하나 베어버렸다는 것은 구불거리던 사행천이 곧게 뻗고, 구부러진 강줄기는 잘려 나가 우각호가 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하신 아켈로오스의 뽑힌 뿔을 풍요의 상징으로 부르는 것은 범람한 강물로 퇴적된 우각호 주변이 대단히 기름져서 여러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정창훈 글/민은정 그림,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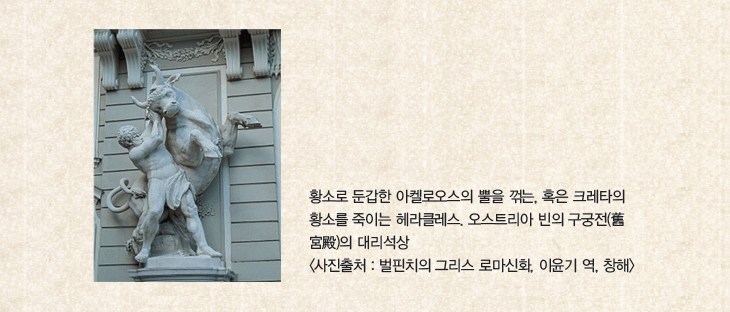
『회남자·천문훈(淮南子·天文訓)』에도 중국의 천상과 지형의 형성을 신화로 해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 공공(共工)과 전욱(顓頊)이 천제(天帝)의 자리를 두고 다투었는데, 공공이 승리하지 못하자 분노한 나머지 서북의 부주산(不周山)에 머리를 들이박았다. 하늘을 지탱하고 있던 천주인 부주산이 부러지고 말았고, 하늘에 매어 있던 끈도 끊어지고 대지의 일각 역시 함몰되고 말았다. 이로부터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어져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모두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대지는 함몰되어 동남쪽이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물길이 진흙과 모래와 함께 그쪽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중국의 원시인류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광활한 토지를 조감할 수 없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토지가 서쪽은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모든 강이 동쪽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가고, 하늘의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지와 우주의 천체구조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그리고 위대한 가설을 세웠으며, 그것을 자신들만의 인식 방법으로 해석하고 설명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공촉산(共工觸山)의 신화가 갖는 의미인 것이다. 신화를 운용하고 강술한 원시인류에게 있어 신화는 그들 특유의 문화 부호이자 사유 암호이며, 신화적 사유가 구비하고 있는 사물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모종의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다. 원시인류는 현대인들과는 다른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자신들만의 특수한 사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화는 바로 이러한 사유의 산물 중 하나다. 때문에 신화는 원시인류의 원시 세계에 대한 해석 체계와 실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인류학자 레비스트 로스(Claude Levi Strauss, 1908~2009)는 신화와 과학의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양자 모두 인류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수립하고 세계를 인식하거나 해석하고자 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과학철학가 포퍼(Sir Karl Raimund Popper, 1902∼1994)는 심지어 신화가 과학의 전기 단계라고 하였다. 그는 신화는 원시인류가 조기관찰을 기초로 한 일종의 가설로서 해석의 수요에 의해 생성된 것이며, 원시의 이론적 틀이거나 과학 이전의 논리 행위라고 하였다. 이 말의 전제는 과학의 체계적 발전으로 보면 과학이 신화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신화의 의의는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왕왕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데 있다. 고대 신화를 가까이하는 것은 단순히 환상의 세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세계를 향한 상상력을 발양할 수 있는 첩경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글˚선정규 (고려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