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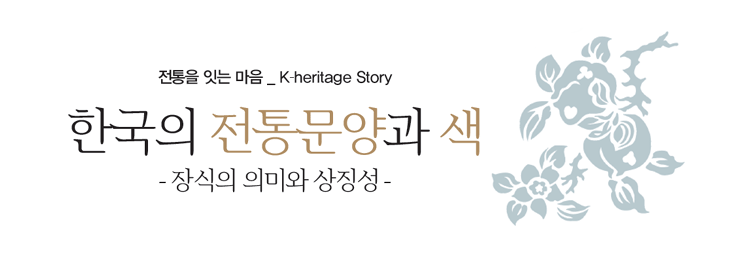
우리고유의 전통문양은 유, 불, 도교의 한국의 전통 자연관을 바탕으로 천지인사상의 자연과 우주에 대한 경외심과 대자연의 생태적 특성을 인간중심으로 관찰하고 해석해보는 인간중심사상으로 장식의 의미와 상징성이 잘 나타나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풍요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종교적 성향을 띤 자연관 사상이다. 또한 이상적인 세계와 자연에 순응하는 가치기준을 상징성에서 찾으려는 복고주의적 정신사상이 전통문양의 배후에 깊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문양은 그 소재가 무엇인가에 따라 동물, 식물, 기물, 기하학 문양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고 의미하는 바에 따라 길상, 다산, 수복, 장수, 공명, 출세, 부귀, 화합, 평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양하다. 전통문양이 어떤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연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류해볼 수 있고, 대상물의 명칭과 관련되어 장식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받은 것으로도 분류해볼 수 있다. 상징성에서 보면 우리의 전통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의 혼과 순결이 깃든 예술품 또는 고궁의 담이나 옛가옥, 생활용품 등 과거의 많은 것들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지닌 전통적인 아름다움으로 한국의 민족성, 풍속, 생활 습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 삼다(三多)는 복숭아, 석류, 불수감을 말하는 것으로 인생의 최대 행복인 수복, 다산, 기원을 상징한다. 삼다(三多)중 석류문양은 주머니 속에 빛나는 붉은 씨앗들이 가득 들어 있어 다손(多孫)과 부귀와 풍요를 상징한다. 특히 석류 덩굴무늬는 혼례복(婚禮服)을 비롯하여 주로 여성이 거쳐하는 안방의 혼수용품, 침구류, 장신구, 가구의 금구장석 문양, 능화판 및 도자기와 단청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한국전통문양의 색은 빨강(赤)색, 노랑(黃)색, 파랑(靑)색, 흰(白)색, 검정(黑)색의 오방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음양의 기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이 되고 두 기운이 나무(木)와 불(火)과 흙(土)과 쇠(金)와 물(水)의 오행을 생성하였다는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을 기초로 한다. 오행에는 오색과 방위가 따르는데 중앙은 황(黃)이고 동쪽은 청(靑)이고 서쪽은 백(白), 남쪽은 적(赤)이며 북쪽은 흑(黑)을 의미한다. 또한 청색과 황색의 중간색에는 녹(錄)색으로 청색과 백색의 중간색에는 벽(碧-짙은 푸른색)색으로 적색과 백색의 중간색에는 홍(紅)으로 흑색과 적색의 중간색에는 자(紫)이며 흑색과 황색의 중간색에는 유황(硫黃-누런색)색이 있어 이들을 오간색(五間色) 또는 오방잡색(五方雜色)이라고 한다. 황(黃)색은 우주의 중심으로 가장 고귀한 임금의 옷을 만들었다.
청(靑)색은 만물이 생성하는 색으로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다. 백(白)색은 순결등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었다. 적(赤)색은 탄생과 애정을 뜻하는 색으로 쓰였다. 흑(黑)색은 삶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으로 쓰였다. 이처럼 음양오행사상에 다양한 색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신부가 연지곤지 색이나 추석과 설날의 명절에 어린아이의 색동저고리, 궁궐이나 사찰의 단청, 안방의 여성의 장신구 등 생활 공예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문양 중에서도 자연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인간이 예술적 활동을 하는 데 영감을 주고, 창의적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원천이 된다. 고전문양 중에서도 자연을 모티브로 한 문양은 자연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안에 많은 상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선조들은 예로부터 문양의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역할로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고전문이나 석류 덩굴무늬처럼 일상생활용품에 쓰이는 장식들 중 자연의 표현과 색, 행복의 상징으로 의미 있는 문양과 장식이 많이 쓰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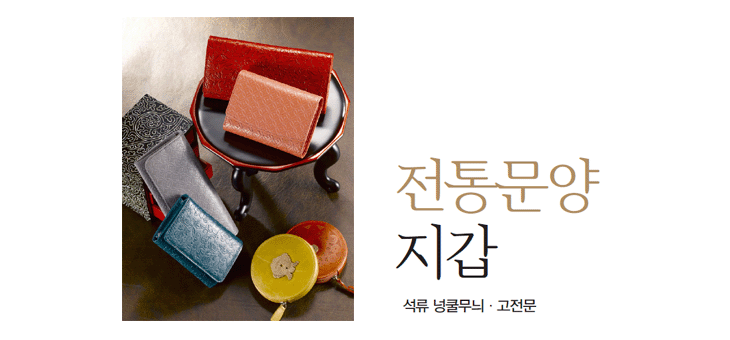

문 의 문화상품팀 02-730-0990 / www.khmal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