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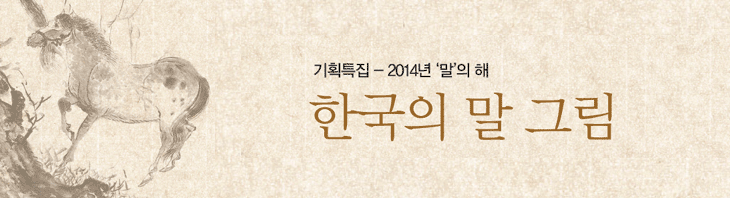
동서양 구별 없이 말은 조형미술에 일찍부터 등장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생명이 긴 소재이다. 이는 헌칠하고 늘씬하며 끼끗하고 당당한 외모가 주는 아름다움, 착하고 성실하며 활기찬 속성, 전장에서 보병에 대해 속도감 있는 기병으로 역할과 빠른 이동수단으로 생활에의 유익함, 신앙이나 종교적 측면에서의 좋은 상징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서양도 말 그림이 적지 않으나, 특히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말이 취한 역동적인 활기찬 기상을 단숨에 필묵(筆墨)으로 나타내기에 적합한 소재인 점이 수묵으로도 즐겨 그려진 이유가 된다.
고구려는 무용총의 <수렵도>를 비롯해 쌍영총 벽화편인 <기마인물도(騎馬人物圖)>는 인물과 말 모두에서 생동감 넘친 유려한 선묘의 적확한 묘사와 채색이 돋보인다. 5-6세기 고구려 고분벽화는 당시 중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 고대회화의 높은 수준을 대변한다. 천년 고도인 신라의 경주 천마총 내 말다래[障泥]에 그린 흰 천마(天馬), 황남대총 북분 출토 칠기 편에 나타난 우마(牛馬), 그림 외에 국보 제91호인 금령총 출토 한쌍의 <기마인물형 토기>와 토기의 뚜껑 등 표면에 부착한 작은 토우들은 신라인의 예술적 자질을 잘 드러낸다. 통일신라 이후 무덤의 호석인 12지 동물 중 말 조각, 화려하고 장엄한 고려불화와 성리학 중심의 맑고 밝은 조선 미학의 대명사인 감상화 그리고 서민의 꿈과 소망 및 익살이 어린 민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조형미술 전반에 말이 줄기차게 등장한다.
조선시대 말 그림은 초부터 말까지 문인화가와 직업화가 모두가 즐겨 그렸다. 동물 그림으로 말만 그린 것과 사람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양분된다. 기마상·수렵·행렬·마구간·세마 등 반려동물로 풍속화와 인물화 범주에도 함께 등장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새 왕조를 세운 제왕들의 말에 얽힌 고사(故事)나, 당시(唐詩) 등 시의화(詩意畫)의 범주에서 서정성이 짙은 그림들도 적지 않다. 한 마리만이 아닌 <삼준도>나 <팔준도>로 지칭되는 것들과, 이들 보다 많은 말이 그려진 <군마도>로 나뉜다.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버드나무에 매인 채 말이 휴식을 취하는 양 한가로운 모습은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치달리는 호쾌한 자세는 병풍 등 대작의 <수렵도>로 일 정형을 이룬다.
새로운 화풍의 수용과 탄생에는 문인화가들이 선구를 보이니 말 그림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중기 화단에선 이경윤·이영윤·이징 등 종친 출신과 김시나 김식 등 문인화가들의 애정 깃든 따사로운 소품 위주의 말 그림이 전해온다. 말 그림의 위치를 공고하게 한 것은 문인화가 윤두서(1668-1715)이다. 남종문인화의 수용과 풍속화의 탄생에서 선두를 점하는 그는 말 그림에 있어서도 역할이 이에 뒤지지 않는다. 말을 키우며 자세히 관찰하고 사생했으며 아들 윤덕희(1685-1766)와 함께 말 그림에서 큰 명성을 얻은 화가이다. 말 그림을 잘 그린 조선 초 화가로는 먼저 안견(15세기)을 들게 된다. 그는 <몽유도원도>를 제작한 1447년과 그 전해에 걸쳐 두 차례 <팔준도>를 그렸다.
제주도 산인 서릿발 같은 흰털에 짧은 귀에 검은 눈을 지닌 강하고 슬기로운 <응상백(凝霜白)>을 비롯해 횡운골·유린청·추풍오 등 여덟 마리 준마 그림은 태조 이성계가 천명을 받아 혼란에서 세상을 구해 새 왕조를 건립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정당화하는 저의가 담겨있다. 여덟 필의 말은 이들 이름이 전하듯 외모와 정면·측면·뒤태 등 이들이 취한 자세도 각기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팔준도첩』은 한때는 윤두서가 그린 것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이는 그가 말 그림에 있어 얻은 명성에 기인하며 현존하는 간송미술관 소장 <삼준도>와 비교할 때 필치의 유사성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화첩 내 발문에 궁중에 비장된 <팔준도> 두루마리[軸]가 사라지자 숙종 29년(1703년) 사대부 집안에 전해진 다른 한 축을 화공을 시켜 그리게 했음이 언급되어 있다. 그려진 연도는 윤두서의 활동시기와 겹치나, 화가 이름은 전하지 않으며 당시 솜씨 좋은 화원의 그림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비록 다시 제작한 것이나 원래 그림에 방불하게 옮겨 그린 어진을 비롯한 초상화가 그러하듯 안견의 화풍에 대한 유추도 가능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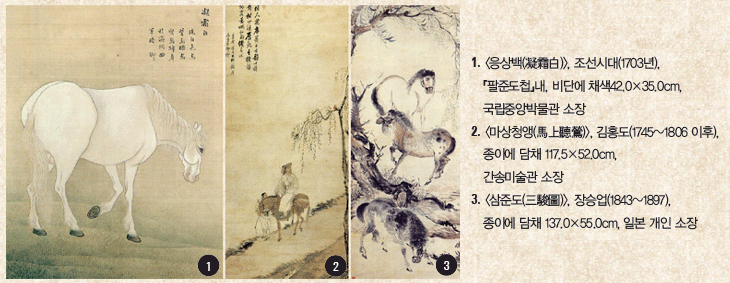
‘조선의 그림 신선[畵仙]’ 김홍도(1745-1806이후)은 <마상청앵(馬上廳鶯)>이 보여주듯 풍속화나 도석인물화에 말을 살필 수 있다. 선비가 봄날 여행길을 나서다 연두색 물오른 실버들 사이로 황금빛 꾀꼬리가 짝을 부르며 우는 소리에 시선이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다. 분위기를 아는 양 말도 멈춰 귀를 세웠고 하인의 눈도 주인과 같은 곳을 향한다. 조선 후기화단에 있어 김두량의 개, 최북의 메추라기, 변상벽의 고양이, 정홍래의 매, 장한종의 물고기등 한 가지 소재로 이름을 얻은 화가가 등장하니 같은 시대 실경산수나 풍속화가 이룩한 회화사적 성취에 뒤지지 않는다. 말 그림 또한 우리 정서와 미감이 짙은 그림들로 조선전기 종친 출신 화가 이암(1507-1566)의 개와 고양이 그림 이후 독자성과 고유색이 뚜렷해 타국과 구별되는 화풍이니 그야말로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그림들이 아닐 수 없다.
양식화된 문인화를 포함해 회화 모든 장르에 걸쳐 출중한 기량으로 조선말기 화단을 화사하게 장식한 장승업(1843-1897)은 말 그림에서도 걸작을 남기고 있다.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소품 <군마도>, 4폭 병풍에 매 폭 두필씩 말이 취한 다양한 동작을 활달하고 분방한 필치로 전개한 <팔준도>, 현재는 소장처가 국내외 세 군데로 분산되었으나 쌍을 이룬 조류에 말과 고양이 세 마리씩 담은 일괄 4폭에 포함된 <삼준도(三駿圖)>가 대표작이라 하겠다. 물오른 봄날 말들 또한 봄기운[春興]을 느끼는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활달하고 유려한 정학교의 제사와 더불어 네 그림을 함께 볼 때 소재의 특징을 잘 잡아낸 빠르고 힘찬 필선과 번짐의 조화로 화면의 박진감과 생동감이 배가된다. 말 그림은 화본에 의존한 산수화에 비해 중국의 영향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중국풍이 짙은 장승업마저도 이 분야에선 국제적인 화풍만이 아닌 화가 자신만의 색깔과 기량을 선뜻 드러내 보인다.
앞선 시기에 전술한 동물화의 소재들이 그러하듯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사생이 용이하기에 독자적인 화풍을 이룬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0세기 화단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김기창(1913-2001)도 말을 잘 그렸다. ‘조선 삼대화가’인 안견·김홍도·장승업 등이 보여주듯 거장(巨匠)의 필수 조건에 말 그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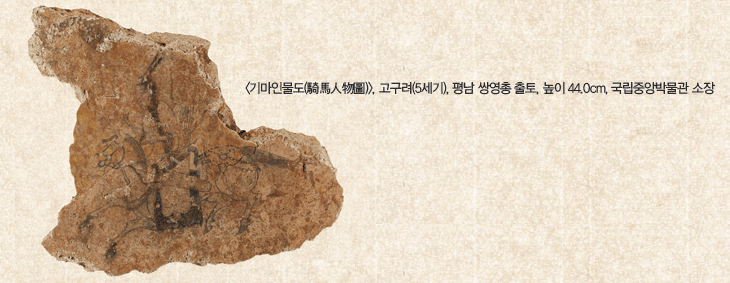
글˚이원복 (경기도박물관 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