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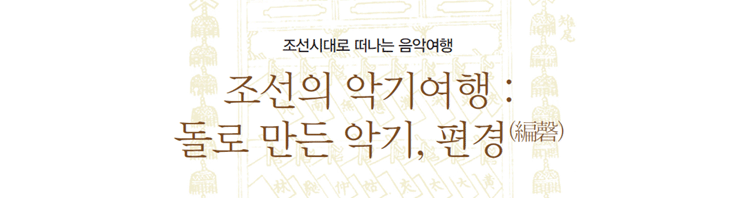
돌과 음악. 두 가지가 잘 어울리는가? 음악이란 것을 세련되고 정제된 음향에만 국한해놓은 이들에게는 이 둘의 조합이 맞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넉넉하게 가져보자. 돌로 연주하는 음악, 그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돌, 나무, 흙, 실, 가죽, 쇠붙이, 박, 대나무. 모두 자연 그대로의 재료이다. 이 여덟 가지를 우리 음악에서는 8음(八音)이라 하여 악기 제작 재료로 활용하였다. 자연의 소리를 음악에 담고자 하는 선인들의 포부가 그대로 엿보인다. 울림이 좋은 경돌을 채취하여 이를 절단하고 잘 연마하여 틀에 걸어놓고 연주하는 악기가 있다. 편경이다. 엮을 편자를 쓰고, 경쇠 경, 굽을 경자를 써서 ‘편경(編磬)’이라 한다. 경돌 열여섯 개를 두 단으로 엮어서 아랫단에 여덟 개, 윗단에 여덟 개를 매달아 한 옥타브와 한 옥타브 위의 네 음, 즉 12율 4청성(淸聲)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악기이다. 황종음(c)부터 협종음(eb)까지이다.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역이기도 하다. 편경은 고려 1116년(예종 11)에 중국 송나라에서 ‘대성아악’이란 제사음악이 유입될 때 함께 들어온 악기이다. 첫 유입 이후 조선 태종 대까지 몇 차례 더 수입되어 쓰이다가 세종 대에 국산화가 실현되어 이후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썼다.
경기도 남양에 위치한 곤달산에서 좋은 경돌이 발견되어 박연을 중심으로 악기를 제작하였고 국산 편경은 중국의 것보다 소리가 월등하게 좋았다. 남양에서 채취한 돌이 좋기 때문이다. 돌의 성질이 단단하면 더 좋은 소리를 낸다. 편경을 제작할 때 음높이는 어떻게 결정될까? 음높이를 결정하는 제도는 크기에 의한 것과 두께에 의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두께로 음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이 옛 제도라는 이유로 동일한 크기의 경돌로 하되 두께의 후박(厚薄)에 따라 음높이를 조정하여 제작하여 썼다. 그렇다면 돌의 두께가 두꺼워야 높은 소리가 날까, 아니면 얇아야 높은 소리가 날까?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곧잘 이를 혼동하여 두꺼워야 낮은 소리가 나고 얇아야 높은 소리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그 반대이다. 두꺼워야 높은 소리가 난다. 이는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가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조선시대 지식인들과 같은 대답을 하곤 한다. 정조임금과 정조 대의 장악원 제조 김용겸과의 대화를 보아도 그러한 정황이 드러난다. 1778년(정조 2) 11월 29일의 일이다. 정조임금이 김용겸에게 “황종 (c음;도)은 얇고 응종(b음;시)은 두꺼운가?”라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 김용겸은 “황종은 두껍기 때문에 소리가 탁하고 응종은 가볍기 때문에 소리가 맑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조선시대에 탁하다는 것은 소리가 낮다는 의미로, 맑다는 것은 높다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황종이 두꺼워서 낮은 소리가 나고 응종이 얇아서 높은 소리가 난다는 김용겸의 대답은 잘못된 것이다. 낮은 음은 두께가 얇고, 소리가 높아질수록 두꺼워지는 것이 편경의 특징이다. 편경은 밀도에 따라 음높이가 조절되기 때문이다. 편경을 제작하는 과정은 조선시대의 악기 제작과정을 기록한 악기조성청의궤(樂器造成廳儀軌)에 상세하게 보인다. 악기조성청이란 악기를 제작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조직하는 임시 기구를 말한다. 제작과정을 보자. 먼저 산에서 덩이 상태로 경돌 원석을 캐낸다. 일정 기준이 되는 원석을 악기조성청으로 올려 보내면 옥을 톱질하는 일이 이어진다. 의궤 기록을 보면 톱질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석경 한 매를 만들기 위해 세 명이 톱질하는 일만 20일, 옥장 세 명이 옥을 다듬는 일이 10여 일 소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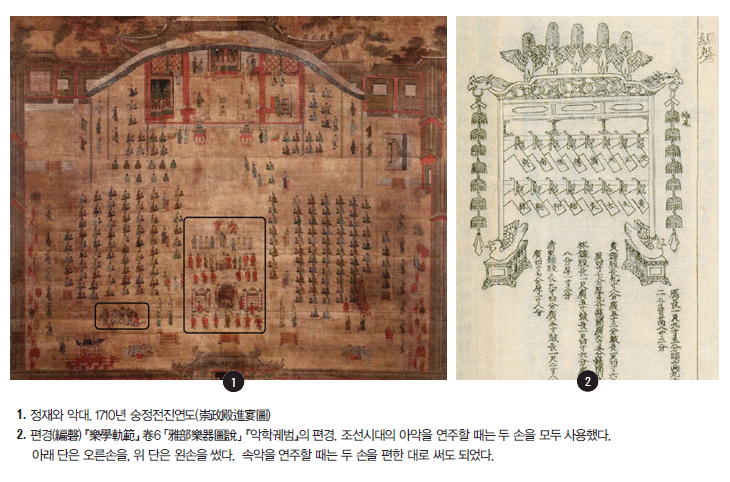
악기 한 틀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톱질을 마친 경돌은 다시 옥을 전문으로 다루는 옥장(玉匠)의 손으로 넘어간다. 옥장에 의해 경돌을 다듬고 갈아서 음률에 맞추는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반드시 일등 장인의 손에 맡겨진다. 그만큼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 귀가 좋고 음률에 정통한 관리를 특별 채용하여 음률이 정확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시킨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 돌을 잘 갈았다 하더라도 음률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공정은 사람의 귀에 의존하게 되므로 귀 좋은 관리가 동원되어 음률의 오차를 판단하고 조정하는 데 투입된다. 편경을 정작 다 만들어놓았지만 음률이 틀려 다시 만드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기 때문이다. 편경 제작과 관련된 세종의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세종실록』에도 그 기사가 보인다. 1433년(세종 15) 1월 1일, 세종이 근정전에서 회례연을 베풀었다. 신년하례와 함께 베풀어진 연회이다. 이때 중국에서 제작한 편경과 새로 만든 편경을 연주했는데, 연주를 마치니 세종이 말한다. “중국의 경은 소리가 어울리지 않으며, 지금 만든 경이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소리를 들어보니 매우 맑고 아름다운데, 이칙음(g#) 소리가 약간 높은 것은 무슨 연유인가?” 박연이 이를 확인하니 미처 갈아내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연도 음률을 잘 아는 신하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듯하다. 결국 귀 좋은 세종에게 걸렸고, 다시 돌을 갈아내어 정확한 음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편경의 제작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므로 대규모 역사로 이루어졌다. 제작이 어려운 만큼 그 보관의 문제도 중요했다. 특히 난리가 났을 때 이를 보관하는 일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연향할 때 쓰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종묘나 사직과 같은 중요한 제사를 지낼 때 편경은 필수 악기였기 때문이었다.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제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간주한 왕도 있었다. 이처럼 중요한 악기이니 난리가 났을 때는 이를 잘 숨겨두어야 했다. 연못 속에 숨겨두거나 땅을 파서 묻어 두는 방식으로 악기 보존에 만전을 기했다. 악기를 잘 숨겨두었다는 이유로 난리가 끝난 후 포상을 받은 음악인들도 있었다. 조선시대에 편경을 사용한 음악은 역대 왕과 왕후를 모신 종묘, 토지신과 곡식신에 제사하는 사직제사, 농사신에 제사하는 선농제, 양잠신에 제사하는 선잠제, 그리고 공자와 그의 제자 및 우리나라 유학자를 모신 문묘에서 제사하는 문묘제례 등의 음악을 비롯하여 가례, 군례 등 여러 의례에서 사용하였다. 뿔망치인 각퇴(角槌)로 경석의 몸체를 때리면 소리가 난다. 빠른 음악을 연주하는 데는 적합지 않다. 한 음 한 음 정성 들여 연주하면 그 소리는 장엄하게 공간을 울린다. 돌의 소리는 묵직하고 은근하여 마음속에 여운이 깊이 새겨진다.
글˚송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