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한다. 여기에 더해지는 단청은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미적욕구의 표현이며, 차별화된 장식으로 계급이나 신분을 표시하거나, 장식되는 문양이나 색상에 주술적 의미를 담는 기원의 방법이 되었다.
오늘날 단청은 목조건물에 채색하여 무늬를 그리는 것을 가리키는 건축용어이지만, 오래전 사용되던 단청의 의미는 ‘그림을 그리다’ 라는 폭넓은 의미를 가졌었다. 우리나라 단청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해지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고대단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서 전해지는 신라의 솔거(率居)가 황룡사 벽에 그린 노송에 새들이 날아와서 앉으려다 떨어지곤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은 고려 궁궐에 칠해진 단청을 장엄하고 화려하다고 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건축양식의 발달로 다포(多包)집 양식이 많이 사용되면서 단청의 화려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도서원(圖書院), 조선시대에는 도화서(圖畵署)와 같이 관청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화공을 관리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단청장(丹靑匠)이라고 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어 전통의 기법과 기술을 전하고 있다.
단청은 광물질 안료와 접착제를 섞어 청·적·백·흑·황의 기본 5가지의 색을 사용한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잡찬집(雜纂集)』에서는 단청의 5색이 오행(五行)사상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단청에 사용된 색은 동양철학의 만물 생성과 소멸을 관장하는 기운을 담아 현세의 안녕과 내세의 소망을 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바람은 단청에 사용된 여러 문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청문양은 기하학무늬, 당초무늬, 천지자연물, 동·식물무늬, 길상무늬, 종교무늬 등으로 매우 다채로우나 사용된 모든 문양은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화문은 불교의 상징화이기도 하며, 유교에서는 군자를, 민간신앙에서는 다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십장생 중 하나이기도 한 구름은 불로장생을 뜻하며 비를 내리고 거두는 모습은 농경사회에서 길흉을 점치는 상서로운,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다.
단청무늬는 구성에 따라 단독무늬, 머리초, 비단무늬, 별화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머리초’는 각 부재의 끝머리 부분의 장식으로 여러 다양한 무늬가 결합, 재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 단청무늬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초’는 각종 꽃을 핵심으로 다양한 문양요소가 부가되어 복합적인 패턴으로 형성된다. 단독무늬로 많이 사용되는 ‘둘레방석’은 약간 넓은 구획면의 일부에 단독무늬를 넣고 그 둘레에 색실과 굵은 먹선을 감아 돌린, 방석 모양으로 된 무늬다. 이 문양은 불교의 칠보에 속하는 보석인 마노의 형상에서 따온 것으로 불교의 장엄을 표현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장식문양이다. ‘휘’는 여러 개의 색 띠를 일컫는 것으로 그 모양에 따라 ‘직휘’, ‘늘휘’, ‘인휘’, ‘바자휘’가 있으며 나열된 색 띠의 수에 따라 단휘에서 5휘까지 쓰며 조선 말기 화려해진 단청양식에서는 7휘까지 사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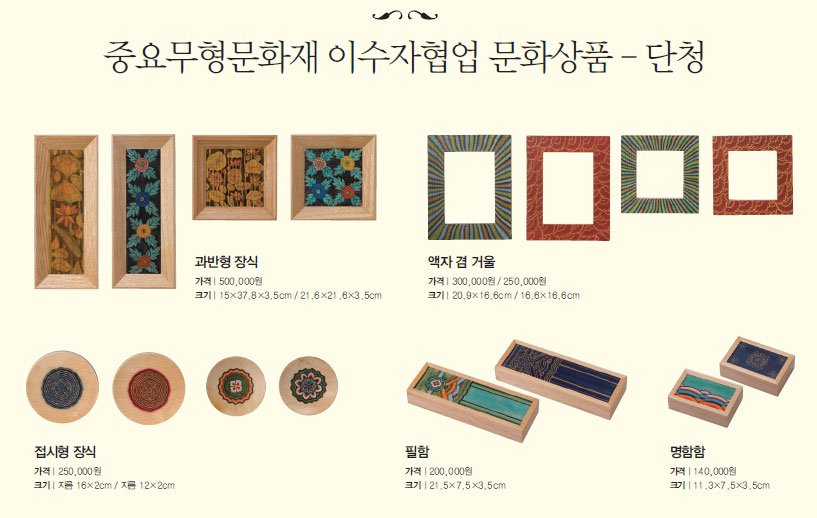
- 글˚신희경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