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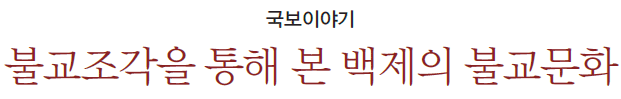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 중국 남조의 동진(東晋)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 당시 동진은 불교를 열렬히 신봉했던 효무제(373-396)의 재위기간이었는데, 동진을 거쳐 들어온 마라난타(摩羅難陀)를 백제에서 융숭하게 환영하고 궁중에서 머물게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백제의 수도 한산에 불사(佛寺)가 세워지고 10명의 승려가 배출되었다. 침류왕의 아들인 아신왕 원년(392)에는 ‘불법을 숭상하여 복을 구하라’는 칙령을 내려 백성들이 불교를 신앙하도록 권장했다.
당시 백제의 사찰에 봉안된 불상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한성시대에 남조 동진(8회)이나 송(18회)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특히 송 문제의 원가 연간(424~453)에 불교가 대단히 융성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원가 14년명(437) 금동불좌상(도 1)과 같은 남조의 초기 선정인 불상이 백제에서도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상과 유사한 예로 부여 규암면 신리 출토의 금동불좌상(도 2)은 비록 조성시기가 6세기로 내려오는 상이지만 한성시대 조각 전통이 반영된 고식(古式)의 상이라고 생각된다.
고구려와 중국 남북조에서 유행한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 형식의 불상이 백제에도 전하는데, 부여 부소산에서 출토한 정지원(鄭智遠)명 금동삼존불상(도 3)은 전체크기가 8.5cm에 불과한 소형상이지만 본존상의 얼굴에서 양감이 느껴지고, 광배 윗면에 정면 3엽의 연화좌에 앉은 화불(化佛)이 양각되었으며, 광배의 뒷면에는 죽은 아내 조사(趙思)를 위해 금상(金像)을 조성한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또한, 서산 보원사지에서 출토한 금동여래입상도 일광삼존불의 본존상이었일 가능성이 크다.
백제 불교계는 활발한 대중교류를 통해 남조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양 무제의 천감연간(502-519)에 백제 승려 발정(發正)이 양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것이나, 성왕 19년(541)에 양에 조공하면서 모시박사, 열반경, 공장(工匠), 화사(畵師) 등을 요청하여 구해온 것 등은 남조 불교와 그 미술이 직접 백제에 전해졌던 것을 알려준다. 그 예로서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한 소조보살상(도 4) 제작에 갈대류의 식물 가지를 묶은 골조(骨組)가 사용된 것은 남경의 홍토교(紅土橋)에서 출토한 남조 소조상 제작에서도 사용된 방법이다.

능산리 절터 출토 소조보살상이 합(盒) 형태의 지물(持物)을 두 손으로 받쳐 든 도상 역시 양 보살상에서 유행하던 형식으로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삼존불상의 파편)(도 5)에서도 보인다. 이와 같은 ‘합’ 형태의 지물은 백제조각에서 점차 둥근 구(球) 형태의 ‘보주’로 바뀌어, 이른바 ‘봉보주(奉寶珠)’ 보살상 형식으로 정착되며, 삼국 가운데 유독 백제에서만 유행하여 많은 예가 전하고 있다. 태안마애삼존불상의 중앙보살입상이나 서산마애삼존불상의 우협시 보살입상은 모두 보주를 두 손으로 받쳐든 봉보주 보살상이다.
태안마애삼존불상(도 6)과 서산마애삼존불상은 양감이 풍부하고 사실적인 제(北齊)·주(北周) 〜 수대(隋代)의 불상양식이 백제에 전해져 만들어진 백제조각을 대표할만한 불상들이다. 태안 마애삼존불상에 보이는 ‘삼존불의 중앙에 보살입상이 배치된’ 삼존상의 구성이나 서산마애삼존불상에서처럼 ‘본존상의 좌우에 보살입상과 반가사유상이 배치된’ 삼존상의 구성은 중국 불교조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삼존형식으로 백제조각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태안과 서산의 마애삼존불상 존명에 대한 해석은 백제인들이 신앙했던 석가 혹은 아미타불, 관음과 미륵보살이 함께 조성되었다
는 견해와, 『법화경』의 수기(授記)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다보 또는 연등불), 현재(석가), 미래(미륵)의 시간적 개념의 삼세불(三世佛)을 조성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백제 후기라고 할 수 있는 7세기 전반에서 660년 멸망까지 수말·당초 불교미술의 도상과 양식이 전해져 부여 규암면 출토의 금동보살입상(도 7)에서처럼 보관 중앙에 화불(化佛)이 표현되어 관음보살의 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부여 구교리 출토 석조대세
지보살두에서처럼 보관의 중앙에 정병이 새겨져 대세지보살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얼굴에 양감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한편, 무왕(600~640년 재위)의 익산경영으로 익산지역에 미륵사와 제석사와 같은 사찰들이 창건되면서 대규모 불사가 이루어졌
다. 미륵사에는 삼원에 각각 금당과 탑이 세워져 각 금당에 여러 예배존상들이 봉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원의 서회랑지의 동쪽기단 밖에서 출토한 전불(塼佛) 보살상은 얼굴의 양 뺨과 입술에 탄력이 넘치는 생생한 표정으로 보관의 장식에는 어자문(漁子紋)을 찍어 연주문을 표현하였다.
익산지역의 백제사찰 가운데 639년에 벼락을 맞아 불탔다는 제석사지의 폐기장에서 출토한 소조 천부상(도 8)은 얼굴에 양감이 풍부하면서도 고요한 내면의 성찰이 느껴지는 사실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제석사지출토 소조상들을 통해서 7세기에 들어 백제 소조상제작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청양 본의리요지(本義里窯址)에서 발견된 소조대좌(도 9)는 치마[裙]로 대좌를 덮은 상현좌(裳懸座)로 폭(幅)이 280cm, 높이가
100cm에 달하는 규모이며, 분할·제작하여 소성한 뒤 다시 조립한 것으로 대좌의 크기로 보아서 그 위에 봉안되었던 장육불좌상
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백제에서 소조로 장육불상이 제작되었다는 것은 틀찍기 성형한 3.5cm에서 5.5cm에 이르는 대형 나발이 부여 금강사지에서 출토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수준 높은 소조불 제작기술은 백제 멸망 후 일본열도로 건너간 백제 유민들에 의해 아스카후기[白鳳] 소조불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글˚최성은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