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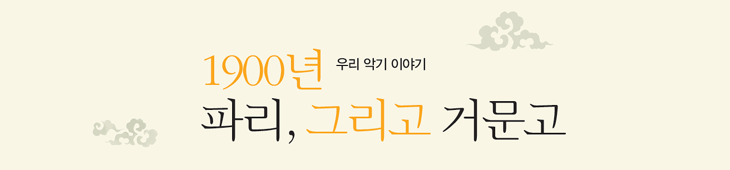
우리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침탈 당한 36년 동안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마음이 아리다. 그보다 더욱 쓰라리게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고품격의 문화적 안목과 식견이 유린 당하고 심지어는 왜곡되기까지 한 것이다. 광복 이후 남겨진 심한 외상은 서구의 물질문명에 의해 치료되고 복구된 듯하지만 본래 가지고 있던 비옥한 문화 유전을 복원하는 데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19세기 후반 한반도에 발을 디딘 파란 눈들을 놀라게 한 것은 가난에 굶주린 이들이 아니라 가난한 그들의 삶 곳곳에 지천으로 널린 예술작품들이었다. 대한제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지낸 이폴리트 프랑뎅(Hippolyte Frandin)은 궁중무희(舞姬)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더불어 산천에 흩뿌려진 절경과 조선인들이 빚어낸 문화에 매료되어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조선 문화를 그리워하였다고 한다. 당시 비운의 왕 고종은 몇 년 후에 열릴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를 외교침탈에 맞서 대한제국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이에 프랑스 외교대사인 프랑뎅에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하여 성사시킨 뒤, 각종 진귀한 조선의 생활용품들을 파리로 보냈다. 1900년 프랑스 파리 센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만국박람회장 한 귀퉁이에 멋있게 세워진 조선관은 조선의 백자를 비롯하여 김홍도의 그림 등 국보급 문화재들의 보물창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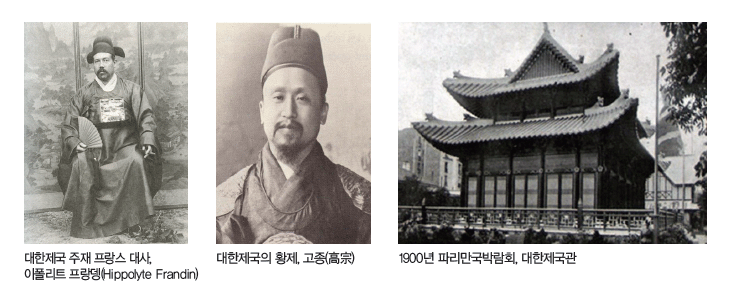
어린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애틋한 심정으로, 파리로 보낼 전시품들을 일일이 챙겼던 고종은 유럽인들을 놀라게 할 만한 악기로 거문고를 선정하였다. 서양의 교양 있는 귀족들이 피아노나 바이올린 음악들을 즐겨 감상하고 더 앞서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갖춘 것처럼 조선의 선비들 또한 거문고를 가장 아끼고 즐겨 연주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악기의 좋은 음향이나 다양한 연주 기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적 효과보다는 좋은 가치를 담아내고 의미를 풀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악기의 줄 이름에서도 네 줄의 바이올린이나 첼로에는 줄 이름이 따로 없다. 그러나 여섯 줄의 거문고는 줄마다 각각 큰 뜻이 있다. 선비들의 올바른 지식과 건강 함양을 나타내는 문현(文絃)과 무현(武絃), 큰 뜻을 기리는 대현(大絃), 온갖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갈구하는 유현(遊絃)이라는 이름을 두고 그 줄들을 울릴 때 꿈꾸는 이상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거문고는 오른손에 술대라는 젓가락 크기의 대나무 막대를 쥐고 줄을 내리치고, 왼손으로 기타의 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16개의 괘 위에 올려진 줄을 눌러 여러 음을 만들어가는 악기다. 이와 같은 연주 방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고구려 사람들의 기개 못지않은 창조적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고구려 재상인 왕산악이 거문고를 제작하여 100여 곡을 작곡하고 연주하였더니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어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으며 후에 학(鶴)자를 빼고 현금(玄琴)이라 하였다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 사람들은 거문고를 아무나 접할 수 없는 상서로운 악기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천인(天人)이 연주하는 거문고 모습을 그려 놓아 후세에도 길이 연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삼국 통일 후 신라 왕실에서는 고구려의 거문고를 보기(寶器)만 간직하는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할 정도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 관리들이 거문고 음악의 전승이 끊어질까염려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 백악지장(百樂之丈)의 위상과 지위를 갖게 되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주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1900년 수십 일의 긴 여정으로 파리까지 온 특이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눈에 들어온 금박을 입힌 학은 금방이라도 거문고 줄을 울리면 날아갈 것만 같으며 나를 응시하고 있는 학의 눈을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사연을 교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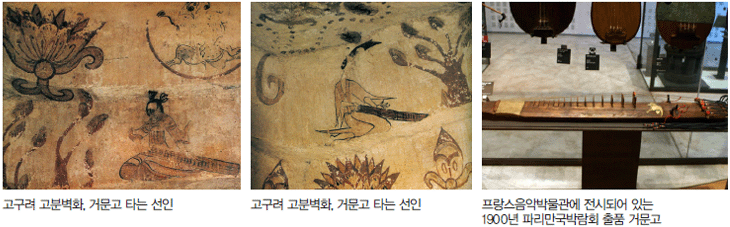
수백 점의 전시악기 가운데 가장 기이한 사연을 지녔으며, 어느 악기 못지않은 가장 아름답고 기품 있는 악기를 마주보고 있는 것 자체가 감동과 행복의 순간이었다. 고귀함과 장수를 상징하는 학은 예로부터 선비들의 이상 세계를 잘 나타내는 길조(吉鳥)라 생각하여 자신들이 즐긴 거문고에 새기는 것을 좋아하였던 것 같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악지(樂志)에 실린 거문고 설화의 내용을, 고려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애용한 청자에 아로새겨두고 보며 청자에서 울려 퍼지는 거문고 음악을 상상하였다. 도공(陶工)은 신수(神樹)를 가운데 두고 거문고를 타는 선비는 학을, 음악 반주에 맞춰 춤을 추는 학은 선비를 바라보게 하여 최선(最善)의 음악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피아노 교본과 같은 조선조 선비들의 거문고 교본인 금보(琴譜) 중 <아양고운(峨洋古韻)>에도 기품 있는 학을 그려놓아 악보를 볼 때마다 학이 상징하는 바를 되새겼다. 조선조 가사 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정철(鄭澈, 1536∼1593)은 담양의 식영정(息影亭)에서 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예전 일들을 떠올려 성산별곡(星山別曲)을 지었다. 그 내용 중에 “거믄고 시욹 언저 풍입송(風入松)이야고야/ 손(客)인동 주인(主人)인동 다 니저 려셔라/ 장공(長空)에 떳난 학(鶴)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하면서 거문고를 즐기고 학처럼 진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글로 남겼다.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해줌으로써 더욱 청아한 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 부들에 줄을 걸게 되어 있다. 그 줄을 거는 부분이 학의 무릎과 닮았다 하여 ‘학슬(鶴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거문고의 지판(指板)을 괘(棵)라고 하는데 거문고 여섯 줄 중 세 줄이 괘 위에 올려지게 된다. 멋스럼을 즐겼던 조선조 선비들은 줄과 괘가 처음으로 만나는 첫 번째 괘에 다양한 색깔의 부드럽고 얇은 천을 덧댄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조선조 선비들은 귀루(鬼淚)라고 이름하였다.
악기의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귀루가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고 없고 차이가 곧 명품인지를 가늠하게 되며 거문고 주인의 인격까지도 유추해볼 수 있다. 서양인의 눈에 처음으로 비쳐진 이 멋진 거문고는 연주 방법이나 음색 등을 정확하게 들어볼 수는 없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그들도 이 악기가 조선의 왕이나 수준 높은 귀족의 명기(名器)임을 쉽게 알아내었을 것이다.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가 끝나고 각국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은 한국의 악기에 동메달을 수여하였다. 수많은 전시품 중에 악기에 상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특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생소한 악기에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최상의 공예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1900년 문화만이라도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고종의 꿈은 거문고에 새겨진 학처럼 날아 사라졌다. 고종이 보낸 거문고는 이제 말없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에펠탑 광장에 모인 세계 시민들은 한류에 열광하며 Corea의 음율에 몸과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약소국에 최빈국으로 파리만국박람회에 참가하였지만 박람회가 끝나고 국내로 환송할 경비가 없었다. 고뇌 끝에 전시품을 모두 기증하고 돌아와야만 했던 당시 한국대표단의 민영찬과 그 소식에 울분을 삼켜야 했던 고종은 이제 환히 웃어도 좋을 것 같다. 그 당시 남겨진 거문고에 그려진 학이 국제적 문화적으로 달라진 위상을 두 눈에 담아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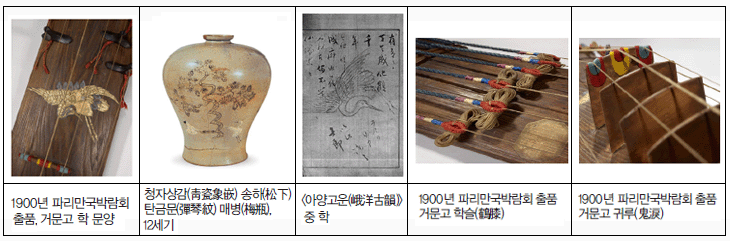
글˚주재근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