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2013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았다. 옛날에는 종로에서 종을 쳐 시간을 알렸다. 그 풍습을 이어받아 새해 첫 새벽에는 서울시가 주관하여 종각에서 타종행사를 연다. 조선 왕조는 그 시작과 함께 서울 도성(都城)의 4대문과 4소문을 여닫는 일을 종소리에 맞추어 시행했다. 새벽 4~5시에는 파루(罷漏)의 종을 서른세 번 쳐서 통행금지를 마치고 성문을 열었고, 밤10시쯤이면 종을 스물여덟 번 쳐서 통금, 즉 인정(人定)을 알렸다. 원래의 ‘보신각(普信閣)종’(보물 2호)은 조선 초에 만든 것인데, 파손되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고, 1985년 국민의 성금으로 다시 만든 종으로 대신하고 있다. 새로 만든 보신각종의 모델은 바로 우리나라 최대의 범종으로 통일신라시대인 771년에 만들어진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국보 29호)이다. 무궁화 꽃을 새로 디자인하여 만든 지금의 보신각종과 겉보기는 크게 다르지만…….
경주국립박물관 마당에 있는 ‘성덕대왕신종’ 은흔히 ‘봉덕사(奉德寺)종’ 또는 ‘에밀레 종(에밀레종)’으로도 알려져 있다. 원래 봉덕사에 있었다하여, 또 그걸 만들 때 어린아이를 공양하여 넣어 희생된 아이 울음이 들린다 하여 각각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 종은 771년(혜공왕 7년)에 완성되었다. 경덕왕은 아버지 성덕왕과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구리 12만 근을 들여 종을 만들었다. 하지만 경덕왕은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고, 아들 혜공왕이 이어받아 완성했다. 혜공왕은 당대의 최고 관리인 대각간 김옹(金邕)과 각간 김양상(金良相)을 시켜 종을 완성했다. 이 종에 새겨놓은 글[銘文]을 보면 이들은 당대의 최고 관리로, 특히 김양상은 780년 선덕왕(宣德王 780~785)이 된 인물이다. 이들이 등장하는 명문(銘文)에는 그 책임자 9명 말고도 4명의 기술자 이름이 보인다. 그들은 주종대박사(鑄鐘大博士) 대나마(大奈麻) 박종일(朴從鎰), 차박사(次博士) 나마(奈麻) 박빈나(朴賓奈), 나마(奈麻) 박한미(朴韓味), 대사(大舍) 박부악(朴負岳) 등이다. 앞서 등장한 관리 9명이 모두 김(金)씨인 것과 달리, 이들 기술인은 모두 박(朴)씨다. 당시의 어떤 사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또 이들 기술 인력의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다른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한 시대라면 이 정도 크기의 종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당연히 서울 보신각의 종은 힘들지 않게 복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1300년 전 세상에서는 이만큼 큰 종을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터다. ‘성덕대왕신종’은 높이 3.75m, 입지름 2.27m, 두께 11∼25㎝이며, 무게는 18.9톤으로, 당시 기록에는 구리 12만 근을 녹여 부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꺼번에 그 많은 양의 구리를 녹여서 한곳에 부어 넣어 이렇게 큰 종을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전해지는 삼국시대 종은 하나도 없다. 지금은 절[寺刹]마다 종이 있고, 따라서 종은 모두 범종(梵鐘, 불교의 종)으로 여겨질 지경이다. 범종은 시각을 알린다는 의미 말고도 중생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일깨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분명히 삼국시대에도 많은 절에 종이 세워져 있었을 테지만, 그 확실한 유물은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통일신라 때 것으로는 771년의 ‘성덕대왕신종’이 725년의 상원사(上院寺) 동종 다음으로 꼽힌다. 강원도 오대산의 상원사에 있는 동종은 높이 1.67m에 입지름 0.9m로 무게가 1.2톤이니 ‘성덕대왕신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편이다. 8세기의 기술로 만들기가 휠씬 수월했을 듯하다. 사실은 《삼국유사》 권4에는 이들 두 범종이 만들어진 중간 시기에 훨씬 큰 종을 만든 기록이 보인다.
황룡사(黃龍寺) 종이 그것이다. 754년 경덕왕이 황룡사에 높이 1장 3촌, 무게 49만 근에 달하는 큰 종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76년부터 발굴이 시작되면서 황룡사 터에서 종루터를 발견했지만, 그 크기를 정확하게 짐작할 수는 없다. 기록상으로는 ‘성덕대왕신종’이 12만 근의 구리를 쓴 데에 비해 황룡사 종은 49만 7000근의 구리를 녹여 만들었다니, ‘성덕대왕신종’의 네 배나 되는 큰 종이라 여겨진다. 725년의 상원사 종, 754년의 황룡사 종, 그리고 771년의 성덕대왕신종…… 이들 셋 가운데 가장 큰 황룡사 종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려시대 때 침입한 몽골이 동해 바다에 빠뜨렸다는 전설이 있어서, 몇 년 전에는 감은사 앞 일대 바다를 조사한 일도 있지만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만든 통일신라 시대 때의 범종은 그 소리가 좋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특히 그 소리의 맥놀이가 일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파수가 다른 음파가 서로 어울려 내는 소리의 조화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역시 그 기술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신라의 범종에는 그 꼭대기에 음통(音筒)이 달려 있어 이웃 나라 중국이나 일본의 종과는 다르다. 또, 걸개로 사용하기 위한 용 모양도 다른 나라의 두 마리와 달리 신라 범종에서는 한 마리의 용으로 장식되어 있다. 게다가 ‘성덕대왕신종’의 표면에는 구름 위의 연꽃무늬 좌상에 무릎을 세우고 바람에 옷자락을 휘날리며 공양하는 보살을 그려넣어 그 아름다움이 돋보이기도 한다. 1300년 전에 이만 한 큰 종을 만들어내는 일은 기술상으로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 어려운 일을 완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종에 새겨져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들에 대해 전혀 알아낼 길이 없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어느 곳에도 이들에 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당시 종 만드는 이들 기술자, 즉 여기 ‘주종대박사’(鑄鍾大博士)라 표시한 박종일은 벼슬이 5두품 ‘대나마’였음을 알 수 있다. 기술자 4명 가운데 제일 높은 인물도 관등이 겨우 5두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기술자는 별로 높임을 받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듯하여 씁쓸하다. 과학기술이 날로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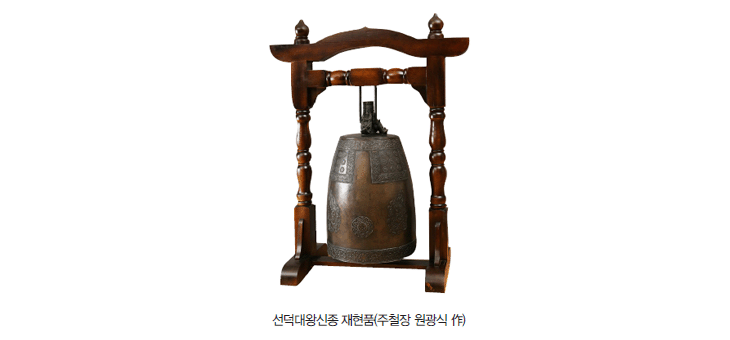
글˚박성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