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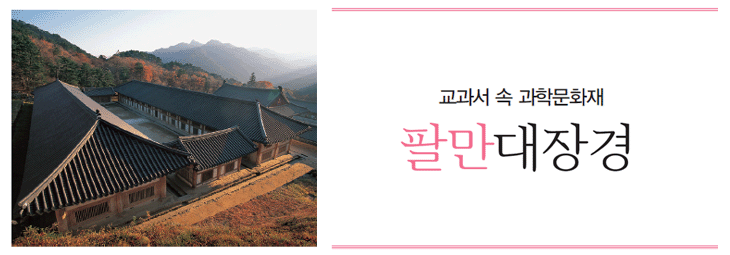
우리나라 인쇄술 발달을 대변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팔만대장경이다. 경상남도 합천(陜川) 해인사(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는 이 불경은 8만 장이 넘는 나무판(木板)이다. 정확하게는 81,258판(板)인데 한 장을 언제든지 꺼내놓고, 그 위에 먹물을 바르고 종이를 얹어 문질러 내면 두루마리 한 장의 불경을 찍어낼 수 있다. 지금은 손으로 만져보기는커녕 문틈으로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로 중요하게 보관되고 있지만, 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찍어낸 일이 많았다. 당연히 인쇄된 것이 여기 저기 퍼졌고, 일본에도 수많은 인쇄물이 전해져 있다. 인쇄의 ‘기술’로만 본다면 금속활자의 발명과 사용을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지만, 인쇄 ‘문화’로 보자면 단연 팔만대장경이 세계 제일의 우리 유산이다. 이미 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우리에게 남겨준 대단한 유산이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자랑거리를 기념하여 2년 전에는 해인사 일대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2011.9.23~11.6)을 열었는데, 올가을에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2013.9.27~11.10)을 개최한다는 소식이다. 고려의 대학자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문집에는 ‘대장경을 새겨낼 때의 기도문’(1237)이 남아 있다.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다.
“원하옵건대 제불성현 삼십삼천(諸佛聖賢三十三天)은 간곡하게 비는 것을 양찰하셔서 신통한 힘을 빌려주어 완악한 오랑캐가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하여, 전쟁이 그치고 중외가 편안하며, 모후(母后)와 저군(儲君)이 무강한 수를 누리고 나라의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되게 해주신다면, 제자 등은 마땅히 노력하여 더욱 법문(法門)을 보호하고 부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제자 등은 간절히 비는 마음 지극합니다. 밝게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요컨대 거란과 달단 등 북방민족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일념에서 당시 구할 수 있던 모든 불경을 목판에 새겨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의 국가적 사업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고려사>를 보면 성종 10년(991)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송나라에서 불경 내지 대장경을 수입해왔다. 원래 불경을 목판으로 만드는 일은 송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고려가 이를 본받아 11세기 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이를 제작했으니 “처음 만든”이란 뜻에서 이 초기의 작품을 ‘초조’(初雕) 고려대장경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대장경은 고종 때 몽고의 침입으로 거의 불타버렸다. 그러자 고려는 1237(고종 24)년부터 16년 동안 국력을 기울여 대장경을 다시 판각하기에 이른다. 대장경 한 장의 크기는 가로 72.6센티미터, 세로 26.4센티미터, 두께 4센티미터 정도, 양 끝에 나무 조각을 붙였고, 네 귀퉁이에는 구리 장식을 달았다. 대개 23줄, 줄마다 14자씩이다. 글자 수가 5,200만이라니 우리 인구만큼 많다. 그 무게는 280톤, 경판 81,258장을 전부 쌓으면 그 높이는 3,200미터, 백두산(2,744미터)보다 높다. 대장경이란 표현은 원래 ‘세 개의 광주리’란 뜻의 산스크리트어 ‘트리-피타카’에서 유래했는데 ‘삼장(三藏)’이라 옮기기도 한다. 부처님 설법 경(經), 교단이 지켜야 할 율(律), 이를 해설한 논(論)을 원래 세 개 바구니에 따로 보관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경판은 글자를 새기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데 능숙한 기술자라도 하루 40∼50자가 고작이다. 그러므로 각자장(刻字匠) 한 명이 한 달에 경판 두 장을 만들기도 어려웠을 듯하다. 결국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총인원은 100만 명이 넘는다. 나무를 베어 가공해 판을 만드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로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동원된 작업이었다. 주로 산벗나무(70%)와 동백나무(13%)를 사용하였으며 10여 가지 나무가 섞여있다. 제주도·완도·거제도 등에서 나무를 베어 와서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소금물로 삶은 다음 그늘에 말렸다. 불경을 새긴 다음에는 옻칠을 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했다. 뒤틀리지 않게 각목을 붙이고 네 귀에는 구리 장식을 달았다. 구리판을 고정하는 데 쓴 쇠못은 95% 정도의 순도를 가진 것으로 상당한 제철 기술을 보여준다.

우리의 팔만대장경은 또한 중국-한국-일본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교류 현상이기도 하다. 이규보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거란과 달단, 몽고 등의 침략과 관련된 국가적 기원을 담은 대사업이었다. 하지만 특히 일본은 거듭 고려와 조선에 대장경을 나눠주기를 간절하게 희망했고, 그 결과 대장경을 일본에 건네주거나 인쇄해 나눠주었던 기록도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자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음독 자결한 황현(黃玹 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은 대장경이 여러 차례 인쇄해 보급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초에는 태조 2년(1393) 인쇄한 것을 시작으로 세조 정유년(잘못된 기록인 듯?), 연산군 6년(1500), 태황제 을축(1865?), 광무 3년(1899)에 인쇄했고, 그 밖에도 민간에서 인쇄한 예가 많다고 전하고 있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대장경을 몇 차례 일본에 가져가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황현의 글에는 왜승(倭僧, 일본 승려) 좌등(佐藤: 사토)이 1910년 그런 계획을 꾸며 당시 사람들의 울분을 불렀다고도 한다.
문화재청은 해외에 있는 우리 전적(典籍)-기록물 가운데 학술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을 조사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최근 일본 오타니대학(大谷大學) 소장의 고려대장경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발간한 일도 있다. 일본에는 이 밖에도 대장경 유물이 여럿 남아 있다. 그것들을 전부 조사해 복사해오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대장경은 조선 초기까지 강화도 선원사(禪源寺)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해인사로 언제 옮겨졌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태조 7년(1398)에 옮겼을 것이라는 학설이 있고, 이때 2,000명의 군인들이 호송하고, 5교양종(五敎兩宗)의 승려들이 독경(讀經)했다고 한다. 아마 그때 건설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장경의 보관 건물 장경판전(藏經版殿)은 너무나 과학적으로 완벽해 오랜 기간 대장경을 완벽하게 보관해왔다.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벽한 보관시설이어서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팔만대장경판 역시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8만 장을 넘는 대장경 판이 국보일 뿐 아니라 그걸 보관하는 건물도 국보인 것이다. 팔만대장경 한문 영인본이 있음은 물론, 한글 번역본(2001) 318권도 완간되었다. CD-ROM으로 나왔을 뿐 아니라 요즘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다. 해인사는 일반인 누구나 기증자의 이름을 써넣은 동판(銅版) 대장경을 만드는 일도 시작하고 있다.
관련교육과정 :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
글˚박성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