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국유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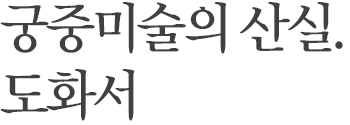

도화서, 나라의 그림을 담당하다
도화서는 궁중의 의례와 제향祭享, 조례朝禮 등과 더불어 그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예조禮曹 아래에 설치된 기구로, 왕실의 결혼과 상례를 비롯해 외국 사절단의 접대나 궁궐 영건營建 등 궁중의 일상과 이 모든 현장을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도맡은 관청이다.
도화서는 400년 넘게 조선왕조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제도상 변화를 겪기도 하였으나, 1910년 국권피탈國權被奪과 더불어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명실공히 궁중미술의 산실産室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적으로 그림을 관장한 부서가 없던 것은 아니나, 도화서만큼 오랜 기간 존립하면서 수많은 화원들을 배출한 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소하다.
도화서 소속 화원들이 참여한 업무의 범위는 그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하였다. 국왕의 권위와 왕실의 평안을 기원한 그림, 국왕과 공신功臣들의 초상화, 대내외를 치장한 장식화, 각종 연회 장면을 그린 행사도, 궁궐도, 의궤 도설圖說과 지도 제작, 궁중 공예품의 문양 도안, 건축물의 장식처럼 사실적 구현을 위해 정밀한 솜씨가 요구된 작업을 비롯해 왕실에서 주문한 다양한 주제의 감상화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선을 긋고 색을 칠하는’ 모든 행위에 참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화서가 한국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도화서의 기원과 설치
조선시대 도화서처럼 중앙관서에 화업畵業을 담당한 관청을 설치한 전통은 신라시대의 채전彩典에 기원을 두고 있다. 채전은 채칠彩漆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으로, 진덕여왕 5년인 651년에 설치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759년 전채서典彩署로 고쳤다가 다시 채전으로 부서명이 바뀌었다고 하니, 채전은 신라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100여 년간 운영된 유서 깊은 관청이었던 것이다.
신라시대의 채전을 이어 고려시대 역시 그림을 담당한 도화원圖畵院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154고려 명종 8년, 서경西京: 현 평양 분사分司의 관직제도를 정할때 평양에 두었던 관서 중 하나인 보조寶曹 소속으로 도화원을 운영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분사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중앙관서 소속이면서 별도로 지방에 인원과 기능을 분리한 관청을 일컫는 것으로, 개경의 관아를 서경에서 분리한 것이 서경분사였다. 조선시대 도화서는 이러한 고려의 도화원 제도를 전신前身으로 삼아 설치된 것이다. 조선 개국 후 성종1469~1494 이전까지는 조선왕실에서 고려의 제도를 이어 ‘도화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종에 의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도화 직제가 명문화되기 전, 도화원은 왕실과 밀착된 관청 중 하나로 기능을 하였다. 조선시대 도화원이 구체적으로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조선 건국 후부터 화업을 담당한 관청이 중앙 부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도화원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400 정종 2년 4월 6일자 실록기사에 문하부門下府에서 불필요한 관직을 정리하기를 요청하는 상소 중 도화원이 정직正直이 아닌 녹관祿官으로 지목된 관서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1400년 이전에는 도화원이 중앙 소속 부서로 설치되어 이미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 연간인 1405년경에는 예조 소속의 종6품아문從六品衙門 관청으로 명시화되었다. 종6품은 오늘날 동사무소 정도에 해당하는 낮은 위계이다. 도화서를 비롯해 내자시內資寺: 왕실의 음식 및 연회 지원, 장흥고長興庫: 돗자리 등 직조 담당, 조지서造紙署: 종이 생산 담당 등 특정한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된 관청들의 위상이 낮았던 것은 기예技藝를 천시하고 기술직을 낮게 대우한 양반 중심의 이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도화서의 직제와 화원畵員
태종1400~1418을 기점으로 도화원은 국왕 중심의 기구에서 벗어나 예조의 하위 관청으로서 문신들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크게 변모되었다. 태조 재위 시 건국에 필요한 많은 업무를 소화하였음에도 도화원은 예조에 편입된 종6품 기술직 관아로 축소되었고, 1464~1471년 사이에 ‘원院’에서 ‘서署’로 강등되었으며, 도화원의 경거직京官職도 5품직인 별좌別坐에서 종6품의 별제別提로 격하되었다. 도화원이 도화서로 재편된 결과는 1485년 시행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도화서의 운영은 국왕의 직접적인 관할에서 분리시켜 예조의 문신 관료가 직접 전담하고, 실제 도화업무를 담당한 화원들은 기술직으로 천시하여 ‘잡직雜織’으로 엄격히 제한시켜 신분상으로 철저하게 구분된 조직체계를 표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화서의 운영 역시 제조提調와 별제別提가 전담하였고, 국초 도화원 시절 40명 정도이던 정원이 성종 연간에 이르러 20명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20명의 화원은 잡직雜織으로 철저히 제한되었고 법제상 종6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시사화원현직화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직은 겨우 다섯 자리에 불과해 화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도화업무의 원활한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종6품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이른 나이에 도화
서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잉사화원仍仕畵員’ 제도는 퇴직한 화원으로 도화서의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부족한 자리를 두고 화원들끼리 옥신각신한 일화가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도화서의 직제
와 정원은 여러 논의를 거쳐 <경국대전> 반포로 인해 <대전통편大典通編>(1785), <대전회통大典會通>(1865), <육전조례六典條例>(1867) 등 법전이 편찬될 때마다 조금씩 개편되는 과정을거쳤다.
조선 후기 도화서 제도의 정착
조선 중기 동안 조선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힘겨운 전쟁으로 인해 제 기능을 잃어버렸고 왕실의 업무 역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나라 사정은 도화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화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던 어진 제작이 선조1567~1608부터 근 100여 년간 중단되었고 매월 정월 왕실에 바치던 세화歲畵 : 길상용 그림 역시 폐지되어 화원들의 일감이 대폭 줄어들었다.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화원들이 제대로 양성되지 않아 격무에 시달리는 등 도화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화원들은 원래 도화서가 있던 한성부 견평방현 종로 부근에서 쫓겨나 10여 년을 가건물에서 떠도는 생활을 해야 하였고, 급료월급 역시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술에 남달리 관심이 많던 숙종의 의지 덕분에 17세기 중반 이후 도화서의 업무는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
숙종은 도화서가 안정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성부 태평방 지금의 을지로 부근에 터를 마련해 주었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어진의 모사와 제작을 다시 추진하였다. 그리고 현종 때 폐지되었던 세화를 다시 그리게 하였으
며, 많은 어람용 그림을 그리게 해 친히 감상하는 등 화원들에게 궁중 도화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었다. 숙
종 연간 늘어난 도화 업무는 선왕의 문화정책을 계승한 영조와 정조의 등극을 거치면서 더욱 증가되었다.
영조는 10년에 한 번씩 어진을 그리는 전통을 성립시켜어진 제작을 화원의 공식적인 업무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궁중 안팎으로 시행된 각종 공사와 행사, 서적 출판 등이 증가하여 화원들의 역할은 날로 커져만 갔다. 결국 영·정조 연간을 거치며 증가된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도화서 화원과 생도를 각각 30명씩 증원하였으며, 별제가 1명 줄고, 종6품의 겸교수직兼敎授職 1명과 전자관篆字官 2명을 신설하였다. 또한 찰방察訪 별제別提 주부注簿 현감縣監 등 외관직을제수하여 실질적인 직책을 기반으로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도화서가 전통적으로 문신 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왕실의 주요한 도화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18세기 후반에는 이와는 정반대 성격의 화원제도가 운영되었으니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이 그것이다. 정조正祖 등극 후 관료들 중심이 아닌 국왕 중심의 친위적親衛的인 화원제도를 1783년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자비대령화원차비대령화원이라고도 함은 ‘임시로 차출하여 임금의 명령을 대기하는 화원’을 뜻하며, 도화서 화원 중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여 규장각奎章閣 소속으로 활동한 당대 최고수 직업화가들을 일컫는다.
영조에 의해 처음 임시로 운영되다가 1783년 정조가 규장각 소속 잡직雜職으로 공식적으로 직제화하였고, 이후 1881고종 18년까지 약 100년 동안 운영되었다. 1795년 정조가 회갑을 맞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경기 화성 현륭원을 방문한 장면을 그린 화성능행도華城陵幸圖 병풍은 자비대령화원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이렇듯 자비대령화원은 18세기 화단을 주도하며 뚜렷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19세기에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철종~고종 연간을 거치면서 규장각 기능의 축소와 맞물려 형식적인 역할로 전락하였다.
도화서,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개혁에 따른 근대식 관제官制 개편으로 인해 소속이 기존의 예조에서 궁내부宮內府 규장각奎章閣으로 변경되었다. 더불어 이전까지 ‘화원’이라고 불리던 도화서 소속 화가들은 ‘도화주사圖畵主事’를 비롯하여 ‘도화과주사圖畵課主事’와 ‘도화서기랑圖畫書記郞’ 등 변경된 직함을 갖고 활동하였다.
이후 몇 차례 관제개혁이 이어지면서 1894년 시작된 규장각 소속 도화 업무는 1895년 규장원奎章院 소속 기록사記錄司 → 1896년 장례원掌禮院 소속 도사과圖寫課 → 1905년 예식원禮式院 소속 도화과圖畵課 → 1907년 장례원 소속 도화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직제와 명칭만 달라졌을 뿐 당시에도 여전히 도화서 시설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화업을 계승하고 있었다. 조선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간 1910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직제 속에서 도화 업무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으니, 이 무렵 관청으로서 도화서의 기능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조선 초기부터 약 400년 동안 궁중의 모든 도화 업무를 중추적으로 담당해 오던 도화서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화업을 담당한 관청이 폐지되긴 하였지만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 관련 사무를 담당한 기구인 이왕직李王職은 각종 의궤와 어진御眞 모사를 통해 소략하게나마 국가의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궁에서 필요로 한 그림은 비공식적으로 발탁된 어용화사御用畵師들이 담당하였다. 창덕궁 신선원전新璿源殿에 걸려 있던 어진이라든지 창덕궁 대조전과 경훈각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벽화는 궁중에 초빙된 화가들이 그린 것으로, 운명이 다한 나라를 위해 마지막 필력을 불태운 화가들의 자취이다.
- 글. 황정연.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